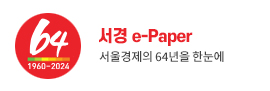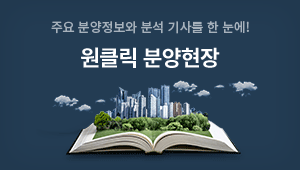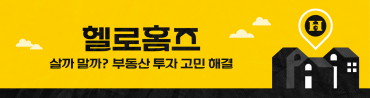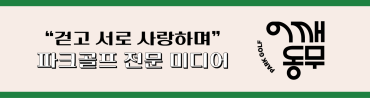-

[역사의 향기/표지석] <23>이회영·이시영 6형제 집터
사회 사회일반 2019.02.17 17:14:14독립운동가인 우당(友堂) 이회영 선생을 비롯한 6형제(건영·석영·철영·회영·시영·호영)의 집터는 서울 중구 명동 YWCA 주차장 앞 소공원 화단에 있다. 백사(白沙) 이항복의 후손으로 명문가의 자제였던 우당은 을사조약 체결 후인 1907년 4월 비밀결사 독립운동 단체인 ‘신민회’를 발족하고 같은 해 6월에는 ‘헤이그 특사’ 파견을 주도하는 등 조국의 독립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우당은 1910년 경술국치를 당하면 -

[역사의 향기/표지석-조선 6조] <22>호조(戶曹)
사회 사회일반 2019.02.10 17:07:06조선시대 중앙행정 기구 6조 중 하나인 ‘호조(戶曹)’는 지금의 기획재정부와 같은 곳으로 조세와 재무를 담당했다. ‘호조터’ 표지석은 서울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건너편의 광화문광장(6조 거리) 바닥에 설치돼 있다. 호조의 별칭은 ‘지관(地官)’ ‘지부(地部)’ ‘지부아문(地部衙門)’ ‘창부(倉部)’ ‘민관(民官)’ ‘민부(民部)’ ‘탁지(度支)’ ‘판도(版圖)’ 등이었다. 고려시대의 호부(戶部)가 판도사(版圖司)로 -

[역사의 향기/표지석-조선 6조] <21>이조(吏曹)
사회 사회일반 2019.01.27 17:00:28조선시대 중앙행정기구 6조 중 하나인 ‘이조(吏曹)’는 지금 행정안전부의 역할을 하던 곳이다. ‘이조터’ 표지석은 서울 광화문광장(6조 거리)의 주한미국대사관 앞쪽에 위치해 있다. ‘천관(天官)’ ‘천관아문(天官衙門)’ ‘동전(東銓)’ ‘전리(典理)’ ‘문부(文部)’ ‘선부(選部)’ 등의 별칭으로도 불렸던 이조는 국가 관리의 임명을 비롯해 공훈, 봉작, 관원들의 성적고사 등의 직무를 맡았다. 이조의 수장은 판서(判 -

[역사의 향기/표지석] <20>세종대왕 집터
사회 사회일반 2019.01.20 17:40:05서울 종로구 통인동에 있는 세종대왕 집터.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2번 출구에서 400m가량 직진하면 ‘세종대왕 나신 곳’이라는 표지석이 있다. 업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성군(聖君)’ 세종대왕은 태조 6년(1397년) 이곳에서 이방원(태종)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네 살 때 아버지가 왕이 돼 경복궁으로 들어갔다. 태종 8년에 충녕대군에 봉해졌다.조선의 네 번째 왕으로 32년 동안 재위했던 세종은 백성을 -

[역사의 향기/표지석] <19>별기군훈련소터
사회 사회일반 2019.01.13 16:59:41‘별기군훈련소터’ 표지석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평창경로문화센터 앞에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식 군대인 별기군(別技軍)은 지난 1876년 체결된 강화도조약이 창설의 발단이 됐다. 제국주의의 침투에 맞서기 위해 신식 군대의 필요성을 느낀 고종은 1881년 별기군을 설치하고 지금의 종로구 평창동에 훈련소를 만들었다. 양반자제들로 구성된 별기군은 구식군대 소속 군인들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대우를 받았다. 이런 차별에 -

[역사의 향기/표지석] <18> 사온서
사회 사회일반 2019.01.06 17:29:23‘사온서’는 조선시대 당시 궁중에 술과 감주(단술)를 공급하기 위한 관청으로 사온서 터 표지석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뒤 공영주차장 입구에 있다. 조선시대에는 사온서가 위치한 이 지역을 ‘사온서골’이라 불렀다. 사온서와 같은 관청은 고려시대에도 있었고 당시에는 왕대에 따라 ‘양온서’ ‘장온서’ ‘양온감’ ‘사온감’ 등으로 불렸다. 고려의 제도를 이어받은 사온서는 태조 1년인 1392년 설치됐으며 조선 후 -

[역사의 향기/표지석] <17>한양도성
문화·스포츠 라이프 2018.12.30 17:15:40서울시내에서 유적의 존재를 증명하는 표지석 혹은 동판이 가장 많은 것은 ‘한양도성’이다. 한양도성은 서울의 내사산(內四山)인 북악산·낙산·남산·인왕산 능선을 잇는 18.6㎞의 조선시대 성곽이다. 1396년 처음 만들어졌고 이후 지속적으로 보수·개축됐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파괴돼 현재 주택가나 도로 등이 지나가는 도심은 성곽의 흔적도 없다. 다행히 최근 복원이 진행돼 원래의 70%인 12.8㎞는 전체 혹은 일부라도 남 -

[역사의 향기/표지석] <16> 경기감영
문화·스포츠 라이프 2018.12.23 17:09:30‘경기감영(京畿監營) 터’ 표지석은 서울 종로구 서대문역 사거리 북쪽 부분에 있다.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의 3번과 4번 출구 사이다. 경기감영은 조선시대 경기도 지역을 관할한 민정·군정·사업기관으로 현재의 경기도청 격이며 지금의 서울적십자병원 일대에 위치했다. 전통시대 서울은 한양도성 내부만을 의미했다. 경기감영은 서대문(돈의문) 바로 밖이다. 경기감영이 경기도의 중심 지역이 아니라 한양에 바짝 붙어 있었 -

[역사의 향기/표지석] <15>경희궁 흥화문
문화·스포츠 라이프 2018.12.16 17:12:48서울 종로구의 경희궁 정문인 흥화문(興化門)은 기구한 팔자다. 인조반정으로 폐위된 광해군이 세웠다는 점에서 불운이 시작됐고 원래의 위치를 잃고 떠도는 신세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사진은 당초 흥화문이 서 있던 터에 있는 표지석이다. 왼쪽 멀리 보이는 서울역사박물관을 포함해 이 일대가 모두 경희궁 궐내였다. 일제는 일본인들을 위한 학교인 경성중학교를 건립하면서 경희궁을 훼손했고 흥화문은 지난 1932년 장충동의 -

[역사의 향기/표지석] <14> 말죽거리
문화·스포츠 라이프 2018.12.09 17:23:19서울 지하철 양재역 4번 출구를 나오면 사진처럼 말 모양을 한 ‘말죽거리’ 표지석이 보인다. 말죽거리는 속칭이고 이곳에 있던 역참의 공식 명칭은 ‘양재역(良才驛)’이다. 역참은 공무 수행자나 일반 여행자를 위한 말을 보관하거나 숙박·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다. 현재 지하철역이나 기차역도 같은 단어 ‘역’을 사용한다. 만약 조선시대 한양에서 남부지방을 간다고 하자. 아침에 남대문을 나서 지금의 반포대교 인근 서 -

[역사의 향기/표지석] <13>평창터
문화·스포츠 라이프 2018.12.02 16:49:27서울 종로구 평창동 329의2 럭키평창빌라 앞에는 사진처럼 ‘평창(平倉) 터’라는 표지석이 있다. 이 동네는 북쪽으로는 북한산, 남쪽으로는 북악산이 웅장한 산세를 자랑하는 완만한 계곡에 들어앉아 있다. 사진의 왼쪽에 북악산의 북쪽 능선이 보인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조선 후기 서울의 방어망을 꾸리는 과정에서 총융청이 있었고 그 군량창고가 ‘평창’이었다. 평창이 있어서 동네이름이 평창동인 셈이다. 총융청 -

[역사의 향기/표지석] <12>훈련원
문화·스포츠 라이프 2018.11.25 17:08:01서울 중구 을지로5가에는 ‘훈련원공원’이 있다. 훈련원(訓鍊院)은 조선 시대 군사기구로 주 역할은 시취(試取), 연무(鍊武) 두 가지였다. 시취는 무과시험 등 군인을 뽑는 일이고 연무는 전술연구 및 무술훈련이다. 무과에 응시한 이순신이 말을 달리다 낙마해 다리를 다친 것도 바로 이곳이다. 문무 겸비의 조선 사회에서 훈련원은 ‘무’를 대표했다. 1907년 일제에 의해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면서 훈련원도 폐지됐다. 훈련 -

[역사의 향기/표지석] <11>광통교
문화·스포츠 라이프 2018.11.18 17:11:02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남쪽으로 가면 청계천을 가로지르는 ‘광교’라는 다리가 있다. 그런데 차도를 건너 신한은행 앞 표지석에는 ‘광통교(廣通橋)’로 적혀 있다. 명칭이 서로 다르다.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원래는 광통교다. 광통교는 조선 시대 한양도성에서 가장 큰 다리였다. 폭 15m, 길이 12m다. 청계천을 건너는 핵심 도로였기 때문이다. 국왕이 경복궁에서 남대문 밖으로 이동한다면 광화문광장을 나와 종로로 -

[역사의 향기/표지석] <10> 선혜청
문화·스포츠 라이프 2018.11.11 17:15:28조선에서 시장경제의 본격적인 활성화는 대동법으로 시작된다. 앞서 필요할 때마다 특산품 현물로 받던 공물을 쌀로 통일했는데 이것이 대동법이다. 1608년 경기도부터 대동법을 실시하면서 설치한 관청이 선혜청이다. 숭례문을 들어서서 바로 동쪽으로, 지금의 중구 남창동 남대문시장 자리다. 대동법 시행으로 전국에서 받은 쌀과 포목·동전을 보관하고 관리했다. 물자가 모이니 인근에 가게가 서고 이후 시장으로 발전했다. 선 -

[역사의 향기/표지석] <9>이순신 생가터
문화·스포츠 라이프 2018.11.04 17:16:31“이순신은 어린 시절 영특하고 활달했다. 다른 아이들과 모여 놀 때면 나무를 깎아 화살을 만들어 동리에서 전쟁놀이를 했다…” 같은 동네에 살았던 유성룡이 책 ‘징비록’에서 이순신을 회고한 내용이다. 이순신은 지난 1545년 3월8일(음력) 서울 건천동에서 태어났다. 지금의 중구 인현동이다. 생가터가 인현동 어딘가라는 것은 그동안에도 알려졌지만 위치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곳은 국내의 대표적인 인쇄 골목이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