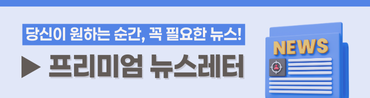-

[시로 여는 수요일] 절경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7.30 17:44:01능성1길 그 골목을 유모차로 가는 할머니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볼 주름 깊게 파서 “누궁고, 모리겠는데 인사해죠, 고맙소.”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어느 국립공원을 가도 보기 힘든 풍경이다. 단체 할인, 경로 할인, 학생 할인도 필요 없다. 경차 할인, 무료 주차도 필요 없다. ‘안녕하세요.’ 한 마디에 열리는 마음의 절경. 두 뺨이 복숭아처럼 붉은 시절도 있었으리라. 머루 같은 눈망울로 아득한 별빛 너머까지 보이 -

[시로 여는 수요일] 선천성 그리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7.24 06:00:00사람 그리워 당신을 품에 안았더니 당신의 심장은 나의 오른쪽 가슴에서 뛰고 끝내 심장을 포갤 수 없는 우리의 선천성 그리움이여 하늘과 땅 사이를 날아오르는 새떼여 내리치는 번개여 그립다고 품에 안았더니, 심장부터 덜컥 포개어지면 어떻게 하나. 천천히 할 말이 많은데 심장만 펄떡거리면 어떻게 하나. 새벽이 왔는데 가슴이 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이불도 개고 밥도 해야 하는데, 출근도 하고 출장도 가야 하는데. -

[시로 여는 수요일] 혼잣말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7.16 17:49:57노인이 흘리는 혼잣말은 텔레비전이 혼자 듣는다. 노인이 흘리는 혼잣말은 냉장고가 혼자 듣는다. 노인이 흘리는 혼잣말은 벽이 혼자 듣는다. 노인이 흘리는 혼잣말은 노인이 혼자 듣는다. 노인이 흘리는 혼잣말은 안에, 안에만 듣는다.살아온 내공이라 부르겠다. 리모컨을 누르면 제 할 말만 떠들어대던 텔레비전이 귀를 쫑긋 세우다니. 문짝을 열면 애 어른 구분 없이 다짜고짜 찬 김을 얼굴에 내뿜던 냉장고가 노인의 말을 듣다 -

[시로 여는 수요일] 무심(無心)에 대하여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7.09 17:58:38어디서 왔는지 모르면서도 나는 왔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서도 나는 있고 어느 때인지 모르면서도 나는 죽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도 나는 간다 사랑할 줄 모르면서도 사랑하기 위하여 강물을 따라갈 줄 모르면서도 강물을 따라간다 산을 바라볼 줄 모르면서도 산을 바라본다 모든 것을 버리면 모든 것을 얻는다지만 모든 것을 버리지도 얻지도 못한다 산사의 나뭇가지에 앉은 새 한 마리 내가 불쌍한지 나를 바라본다 무심히 -

[시로 여는 수요일] 실록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7.02 17:40:45우산과 양산이 되어준 허공 세 평 직박구리 지지고 볶는 소리 서너 되 바람의 한숨 여섯 근 불면의 밤 한 말 가웃 숫기가 없어 뒤만 졸졸 따라다니던 그늘 반 마지기 산까치가 주워 나른 뜬소문 한 아름 다녀간 빗소리 아홉 다발 오디 갔다 이제 왔나 고라니똥 같은 오디 닷 양푼 오디만큼 달았던 방귀는 덤이라 했다 산뽕나무 한 채 헐리기 전 열흘 하고도 반나절의 기념비적 가족사는 이러하였다 일가를 이루었던 세간이며 식솔 -

[시로 여는 수요일] 노각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6.25 17:55:24노각이라는 말 참 그윽하지요 한해살이 오이한테도 노년이 서리고 그 노년한테 달세방 같은 전각 한 채 지어준 것 같은 말, 선선하고 넉넉한 이 말이 기러기 떼 당겨오는 초가을날 저녁에 늙은 오이의 살결을 벗기면 수박 향 같기도 하고 은어 향 같기도 한 아니 수박 먹은 은어 향 같기도 한 고즈넉이 늙어 와서 향내마저 슴슴해진 내 인생에 그대 내력이 서리고 그대 전생에 내 향내가 배인 듯 아무려나 서로 검불 같은 생의 가 -

[시로 여는 수요일] 금계국 웃음꽃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6.18 18:06:04자리를 탓할 입이 금계국에게는 없다 웃음꽃 활짝 피워 주변을 밝힌다 어디든 발붙이고 살면 그 자리가 좋은 자리, 남 탓하는 입이 있었으면 해맑은 웃음 나누기 어려웠으리 금계국이 잡초가 내민 손 뿌리치는 것 본 적 있는가 피눈물 흘리는 것 본 적 있는가 속울음 삼켜보지 않은 이 어디 있으랴 걱정 없는 이 어디 있으랴 울 일보다 웃을 일이 더 많은 게 세상살이라는 걸 깨우쳐 주는 꽃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웃음꽃 -

[시로 여는 수요일] 편하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6.04 17:48:18따뜻한 물 쓰기도 불편하고 화장실 가기도 불편하고 군불 넣기도 불편하고 산길 오르내리기도 불편하다 그렇게 불편을 오래 사용하다 보니 ‘불’자가 떨어져 버렸다산사의 일이 저리 편할 줄은 몰랐다. 편한 건 도시 문명의 전유물인 줄 알았다. 따뜻한 물 언제나 틀면 나오고, 마당 가로질러 화장실 갈 일 없고, 아궁이 군불 넣을 일 없고, 산길 오르내릴 일 없으니 불편한 줄 모르고 살았다. 그렇게 편한 걸 오래 사용하다 보니 -

[시로 여는 수요일] 낙타
문화·스포츠 문화 2024.05.29 05:00:00낙타를 타고 가리라, 저승길은 별과 달과 해와 모래밖에 본 일이 없는 낙타를 타고, 세상사 물으면 짐짓, 아무것도 못 본 체 손 저어 대답하면서, 슬픔도 아픔도 까맣게 잊었다는 듯, 누군가 있어 다시 세상에 나가란다면 낙타가 되어 가겠다 대답하리라. 별과 달과 해와 모래만 보고 살다가, 돌아올 때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하나 등에 업고 오겠노라고,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았는지도 모르는 가장 가엾은 사람 하나 골 -

[시로 여는 수요일] 단둘이 복숭아 꽃잎을 본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5.21 17:40:41둘이 마주 앉아 복숭아를 깎아 먹는다 하나가 아- 하면 다른 하나가 잘도 받아먹는다 하나가 웃으면 다른 하나는 더 크게 웃는다 이 나무 그늘 이 물가에 평상을 놓은 적이 있던가 단둘이 나란히 앉아 꽃잎을 바라본 적이 있던가 어제의 나는 늦게 오거나 아주 오지 않아도 좋다 흘러오는 냇물에 발을 담그고 떠내려 오는 복숭아 꽃잎을 본다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어쩐지 혼자서도 나란나란 하시더라니, 혼자서도 도란도란 하시더 -

[시로 여는 수요일] 봄비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5.07 17:50:12하늘 어느 한갓진 데 국수틀을 걸어 놓고 봄비는 가지런히 면발들을 뽑고 있다 산동네 늦잔칫집에 안남 색시 오던 날혼주들 손이 크기도 해라. 하긴 산동네 마당이 작지 올 사람이 적을까. 바다 건너 안남 색시를 맞는다니 큰 혼사가 아닌가. 산마루 국수틀에 구름반죽 뭉게뭉게 피어오른다. 미처 찾지 못한 하객들 몫까지 아낌없이 국수사리 풀어놓으니 예서 제서 후르륵 호르륵~ 면치기 하는 소리 끊이지 않는다. 얼마나 귀한 인 -

[시로 여는 수요일] 종이컵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4.23 17:40:08딱 한 번 뜨거웠으면 됐다 딱 한 번 입맞춤이면 족하다 딱 한 번 채웠으면 그만이다 할 일 다 한 짧은 생 밟히고 찌그러져도 말이 없다딱 한 번 뜨거웠던 제 몸의 온도를 전해주고 갔구나. 딱 한 번뿐인 입맞춤을 허락하고 갔구나. 딱 한 번 채웠던 소중한 걸 다 비워주고 갔구나. 하루에도 두세 번씩 다른 종이컵과 입 맞추는 날 무심히도 바라보았었구나. 커다란 입으로 말도 없이, 밟히고 찌그러지다가 사라졌구나. 딱 한 번으 -

[시로 여는 수요일] 벚꽃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4.17 06:00:00기적처럼 피어났다 벼락처럼 오는 죽음단 두 행의 시가 종이를 베는 검처럼 예리하다. 벚꽃이 피고 지는 찰나에 대한 통찰이 삶 전체를 관통한다. 무한한 우주 시간 속 어떤 생의 명멸인들 찰나가 아니겠는가. 광년을 달려오는 별빛의 생성과 소멸도 기적처럼 피어났다 벼락처럼 오는 죽음일 수 있겠다. 그러나 아침햇살에 스러질 이슬이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찰나 속에 영원이 깃들어 있을 것이다. 찰나에 응결되지 않는 영원이 -

[시로 여는 수요일] 아름다운 수작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4.02 20:03:05봄비 그치자 햇살이 더 환하다 씀바귀 꽃잎 위에서 무당벌레 한 마리 슬금슬금 수작을 건다 둥글고 검은 무늬의 빨간 비단옷 이 멋쟁이 신사를 믿어도 될까 간짓간짓 꽃대 흔드는 저 촌색시 초록 치맛자락에 촉촉한 미풍 한 소절 싸안는 거 본다 그때, 맺힌 물방울 하나가 떨어졌던가 잠시 꽃술이 떨렸던가 나 태어나기 전부터 수억 겁 싱싱한 사랑으로 살아왔을 생명들의 아름다운 수작 나는 오늘 그 햇살 그물에 걸려 황홀하게 -

[시로 여는 수요일] 먹염바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3.26 17:39:58바다에 오면 처음과 만난다 그 길은 춥다 바닷물에 씻긴 따개비와 같이 춥다 패이고 일렁이는 것들 숨죽인 것들 사라지는 것들 우주의 먼 곳에서는 지금 눈이 내리고 내 얼굴은 파리하다 손등에 내리는 눈과 같이 뜨겁게 타다 사라지는 것들을 본다 밀려왔다 밀려가는 것 사이 여기까지 온 길이 생간처럼 뜨겁다 햇살이 머문 자리 괭이갈매기 한 마리 뜨겁게 눈을 쪼아 먹는다 바다는 생명이 처음 시작된 곳이다. 밀려왔다 밀려가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