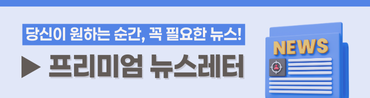-

[시로 여는 수요일]아픔과 깨달음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2.05.11 07:00:00차창룡 오십견을 앓고 나서야 오십견의 아픔을 알았네 아파보지 않은 이가 남의 아픔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았네 사람들은 남들의 고난을 보고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지 내가 오십이 되어 오십견을 앓았듯이 불행할 수 있는 조건을 이미 가지고 있음에도 나는 달라, 애써 부인하면서 가끔은 시궁창에서 피어난 개나리처럼 활짝 웃는 날도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인생 뭐 별거 있어 오십견은 시간이 가면 낫 -

[시로 여는 수요일]낮잠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2.05.04 00:00:00- 신미나 손바닥으로 방바닥을 훔치다 쌀벌레 같은 것이 만져졌다 검지로 찍어보니 엄마였다 나는 엄마를 잃어버릴까봐 골무 속에 넣었다 엄마는 자꾸만 밖으로 기어나왔다 엄마, 왜 이렇게 작아진 거야 엄마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들리지 않는다 다음 생에서는 엄마로 태어나지 말아요 손가락으로 엄마를 찍어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렸다 잠에서 깨어나 눈가를 문질렀다엄마의 치마폭이 성채였던 적이 있었을 것이다. 어떤 외풍과 -

[시로 여는 수요일]등 푸른 생선이 등이 푸른 이유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2.04.27 07:00:00- 박순원 나는 ‘등 푸른 생선’이라는 말이 좋다 ‘등이 시퍼런’보다 푸른이 주는 안전한 느낌 약간 부드러우면서 밝고 건강한 느낌 고등어 꽁치 삼치 참치 방어 정어리 멸치 청어 연어 장어 전갱이 모두들 정겹다 특히 고등어 꽁치 멸치는 매일 만나는 오래된 친구들 같다 필수지방산 오메가-3 중 DHA와 EPA라는 성분을 알고부터 내가 잘 알고 지내던 친구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한 것 같아 뿌듯하고 자랑스럽다 DHA와 EPA를 알 -

[시로 여는 수요일]꽃도둑의 눈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2.04.19 17:46:02- 김해자 자고 나면 갓 핀 꽃송이가 감쪽같이 없어지더니 밤새 금잔화 꽃숭어리만 뚝 따 먹고 가더니 좀 모자란 눔인가, 시 쓰는 눔 혹시 아닐랑가 서리태 콩잎보다 꽃을 좋아하다니 이눔 낯짝 좀 보자 해도 발자국만 남기더니 며칠 집 비운 새 앞집 어르신이 덫 놓고 널빤지에 친절하게도 써놓은 ‘고랭이 조심’에도 아랑곳없이 밤마다 코밑까지 다녀가더니 주야 맞교대 서로 얼굴 볼 일 없더니 어느 아침 꽃 우북한 데서 눈이 -

[시로 여는 수요일]봄날은 간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2.04.13 07:00:00- 구양숙 이렇듯 흐린 날엔 누가 문 앞에 와서 내 이름을 불러주면 좋겠다 보고 싶다고 꽃나무 아래라고 술 마시다가 목소리 보내오면 좋겠다 난리 난 듯 온 천지가 꽃이라도 아직은 니가 더 이쁘다고 거짓말도 해주면 좋겠다유독, 봄날은 간다. 가는 봄이 아쉬워 술을 싣고 전별 가던 옛사람들이 있었다. 지는 꽃마다 봄이 어디로 갔느냐고 묻다가, 뻐꾸기 우는 여름 숲으로 돌아오던 사람들이 있었다. 떨어진 꽃잎을 비단주머니 -

[시로 여는 수요일] 꽃장수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2.04.06 07:00:00- 곽재구 젊은 여자 약사가 할머니의 구부러진 등에 파스를 붙이는 모습을 낡은 손수레가 바라보고 있다 오매 시원허요 복 받으시오 손수레 위 서향 두 그루 라일락 세 그루 할머니가 손수레 끌고 오르막 동네 오르는 동안 햇살이 낡은 지붕들 위에 파스 한 장씩 붙여준다 가난한 집들의 뜰에서 할머니 등의 파스 냄새가 난다 낡은 손수레도 안심이 될 것이다. 구부러진 허리에 매달려 가는 마음 편치 않았을 것이다. 안간힘을 쓰 -

[시로 여는 수요일] 입장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2.03.30 07:00:00- 이화은많이 아프신 듯 몸이 불편한 할머니 손을 할아버지가 꼭 잡고 걸어간다 한 걸음 한 걸음 아껴가며 꼭 잡았다는 말을꼭 잠궜다로 고쳐 말한다 저 견고한 자물통을 열 수 있는 열쇠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은행나무가 면사포 같은 결 고운 단풍잎을 골라 할머니 머리 위에 소복이 얹어 준다단발머리 나풀거리며 깡충깡충 뛰던 시절 있었을 것이다. 또각또각 구둣발소리 내며 도도하게 걷던 시절 있었으리라. 어느 눈부 -

[시로 여는 수요일] 도다리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2.03.23 07:00:00쑥 향기를 제일 먼저 알아채는 건 늘 저승 문턱에 앉았다고 말하는 가사리 김 영감의 입맛 밭 가장자리 쑥 무리가 봄이요, 봄, 하며 목소리 높이자 화들짝 고개 드는 오랑캐꽃까지 봄소식 분분한데 지난봄 도다리쑥국의 달달함이 입속에 아른거린다 너무 오래 살았다고 그렁그렁 게거품 입가에 내뱉더니 닫은 입 열어 주는가 김 영감 낚싯대가 은근슬쩍 살맛을 낚아 올린다 도다리여저승 문턱에 앉은 김 영감이 쑥 향기를 먼저 맡 -

[시로 여는 수요일] 이웃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2.03.16 07:00:00- 이정록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으니 두부장수는 종을 흔들지 마시고 행상 트럭은 앰프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써서 학교 담장에 붙이는 소사 아저씨 뒤통수에다가 담장 옆에 사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한마디씩 날린다 공일날 운동장 한번 빌려준 적 있어 삼백육십오일 스물네 시간 울어대는 학교 종 한번 꺼달란 적 있어 학교 옆에 사는 사람은 두부도 먹지 말란 거여 꽁치며 갈치며 비린 것 한번 맛볼라치면 버스 타고 장터까지 -

[시로 여는 수요일]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2.03.09 07:00:00당신이라는 말 - 나호열 양산 천성산 노전암 능인스님은 개에게도 말을 놓지 않는다 스무 첩 밥상을 아낌없이 산객에게 내놓듯이 잡수세요 개에게 공손히 말씀하신다 선방에 앉아 개에게도 불성이 있느냐고 싸우든 말든 쌍욕 앞에 들어붙은 개에게 어서 잡수세요 강진 주작산 마루턱 칠십 톤 넘는 흔들바위는 눈곱만한 받침돌 하나 때문에 흔들릴지언정 구르지 않는다 개에게 공손히 공양을 바치는 마음과 무거운 업보를 홀로 견디 -

[시로 여는 수요일] 간절기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2.03.02 07:00:00- 박완호 환절기를 보내고 나면 또 다른 환절기가 찾아왔다. 사랑 뒤에 사랑이, 이별 뒤에 이별이, 환절기에서 환절기로 가는 어디쯤에서 삶은 마지막 꽃잎을 떨구려는 건지. 죽음 너머 또 다른 죽음이 기다린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다. 죽음은 늘 다른 누군가의 것이어서, 나는 내내 아파하기만 했을 뿐. 환절기와 환절기 사이, 좁고 어두운 바닥에 뿌리를 감추고 찰나에 지나지 않을 한번뿐인 생을 영원처럼 누리려는 참이었다. -

[시로 여는 수요일] 아주 특별한 죽음의 의식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2.02.23 07:00:00-이시영 20세기 미국 시인 앨런 긴즈버그는 죽기 전에 뉴욕에 있는 그의 집에서 친구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나 이제 가네!”라고 작별인사를 했다고 한다. 역시 20세기 미국 칼럼니스트 부크월드는 자신의 죽음을 ‘뉴욕 타임즈’ 인터넷 판 동영상 비디오에 직접 출연해 알렸다. “안녕하세요, 아트 부크월드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사망했습니다.” 둘 다 인생을 마감하는 큰 행사의 하나인 죽음 앞에서 유머를 잃지 않는 -

[시로 여는 수요일]눈사람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2.02.16 07:00:00- 강영환대설주의보가 지나간 벌판에 서서 햇살만으로도 녹아내릴 사람이다 나는 한쪽 눈웃음으로도 무너져 내릴 뼈 없는 인형이다 벌판을 발자국도 남기지 않고 곁에 왔다 걸어온 길은 돌아보지 않는다 앞서갈 길도 눈여겨보지 않는다 내 지키고 선 이 자리에서 여분으로 남겨진 사랑도 가슴에서 뽑아낸 뒤 흔적 없이 떠나고 싶을 뿐 얼어붙은 바람 속에서 쓰러지지 않는다 그려 붙인 눈썹이 떨어져 나간 뒤 그대 뿜어낸 입김에 -

[시로 여는 수요일] 밥
문화·스포츠 문화 2022.02.09 07:00:00그렇다 쌀을 다 쏟고 나서 그 포대를 세울 때 그 때 바닥으로 다시 떨어지는 몇 낱 알쌀의 그 소리 크다 매양, 그렇다 계량컵의 쌀을 쏟을 때 솥은 깨지는 소리를 낸다 쌀이 쌀 위에 떨어질 즈음에야 그 소리, 잦아든다 그러고 있다 길 없는 귀신의 길도 밥이 내고 밥이 메운다 그렇다쌀도 먼저 맨바닥에 떨어질 때 비명을 지르는구나. 도정까지 마치고, 쌀눈까지 떨어져 눈이 멀었는데도 아득한 바닥이 무섭기만 하구나. 함께 쏟 -

[시로 여는 수요일]어머니의 숨비소리 2
문화·스포츠 문화 2022.01.26 07:00:00- 김영란 그믓 그스멍 느거 나거 바당은 곱가르지 안 ㅎㆍㄴ다 땅 문세 집 문세 문세옌 ㅎㆍㄴ걸 베려나 봐시냐 바당은 그믓 긋지 안ㅎㆍ영…… 게난 살아졌주시깨나 읽어봤지만 첫 줄부터 막힌다. 두 번째 줄로 건너뛰어도 난감하다. 시루떡에 박힌 콩처럼 한두 개 아는 단어를 이어봐도 매끄럽게 뜻이 통하지 않는다. 제주 여행 중 한 찻집에 들렀을 때 만난 시다. 감물 천에 정성껏 쓴 손 글씨 앞에 난색을 표하니 토박이 주인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