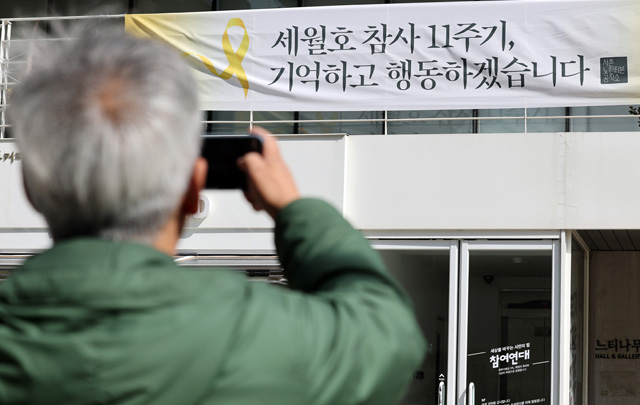오픈 이노베이션 대기업 혼자 못해
배려 아닌 효율·기능성 측면서 변화
기업 아닌 생태계가 혁신주체 돼야
獨 강소기업 80% 대기업에 납품
제때 부품 확보 못하면 생존 위협
대기업은 덩치만 컸지 중기가 甲
“오픈 이노베이션이란 나 혼자 혁신할 수 없는 그런 형태의 혁신 생태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의 주체가 되는 기업 생태계는 수평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18일 서울 중구 반얀트리클럽앤스파서울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상생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에 나선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오픈 이노베이션, 즉 열린 혁신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 생태계가 수평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평적 기업 생태계 구축-우리 경제의 생존전략’을 주제로 열강을 펼친 권 위원장은 “과거에 조지프 슘페터가 말한 이노베이션은 개별 기업의 창조적 파괴로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혁신이었다”고 진단한 뒤 “오픈 이노베이션은 어떤 한 개인 기업인이나 개별 기업이 스스로 모든 것을 디자인하고 모든 것의 주체가 돼 결과를 감지해내는 그런 혁신이 아니다”라고 정의했다.
권 위원장은 오픈 이노베이션 시대를 맞아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중적인 계획경제 생태계가 변해야 한다고 말을 이었다. 그는 “대기업이라면 협력기업과 같이하는 혁신”이라며 “구조화된 형태로 대기업은 기획·지시하고 중소 협력업체는 그것을 성실히 수행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는 (혁신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별 기업이 아니라 기업 생태계가 혁신의 주체”라며 “(이런 점에서) 수평 생태계 구축은 우리의 생존전략”이라고 역설했다.
권 위원장은 제정러시아와 소비에트연방, 북한 등을 예로 들며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의 한계를 지적하고 수평적 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시장원리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설파했다. 그는 “과거 1970년대까지 계획경제를 통해 남한보다 높은 경제 수준을 유지했던 북한이 지금처럼 몰락한 것은 복잡경제에 접어든 뒤 시장경제를 선택해야 할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이라며 “계획경제는 단순경제일 때는 시장경제보다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지만 복잡경제가 되면 계획당국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가져올 수 없고 다 오퍼레이션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중앙집중 계획경제 같은 거함 기업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기업 생태계의 오픈 이노베이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원리 작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 생태계를 수평적으로 바꾸기 위한 방안으로 권 위원장은 갑과 을이 고정된 현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히든챔피언이라고 불리는 독일 강소기업의 약 80%는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 중소기업이지만 대부분은 ‘을’이지 않다”며 “대기업이 이 기업들의 부품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제시장에서 생존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대기업은 덩치는 크지만 을이 되고 오히려 강소기업이 갑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권 위원장은 수평적 기업 생태계는 단순히 도덕적인 측면에서 ‘중소기업을 배려하자, 같이 살자’고 말하는 것을 넘어 기능성의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해야 되며 수직적인 기업 생태계를 수평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말이 사회정책적인 측면에서 중소기업을 배려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주장처럼 들릴 수 있다”면서도 “당위적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효율성과 기능성 측면에서, 또 경제의 작동을 위해 생태계의 변화는 필수적인 과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권 위원장은 1840년대 초반 아동노동보호법을 통과시킨 독일의 사례를 들며 도덕적 당위성 외에 기능성이 함께 인정받을 때 사회가 변화한다고 설명했다. 과거 독일은 12세 미만 아동에게 하루 9시간 이상 노동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아동노동보호법을 통과시켰는데 국방부가 나서서 이 법안을 입안했다는 것이다. 어린아이들에게 과한 노동을 시킨 결과가 군대에서 제대로 된 훈련도 받을 수 없을 정도의 허약한 체력으로 이어져 안보 위기를 느끼게 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권 위원장은 “아동에게 학교 교육을 제공하지 않고 노동 현장에서 혹사하면 안 된다는 도덕적인 주장이 이전이라고 왜 없었겠느냐”며 “하지만 이 주장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결국 이 주장이 당시 사회의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주의적인 안보관과 매칭되면서 ‘기능성’이 비로소 알려지고 입법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권 위원장은 “지금 우리가 유신체제나 개발독재와 같은 체제로 돌아가면 다시 10%대의 경제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며 “도덕성에 대한 비판을 받으면서도 효율성이나 기능성에 연명해 유지됐던 개발독재 체제가 이후에도 계속됐다면 결국 기능성마저 상실하고 나락으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eona@sedaily.com
yeo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