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은 어렵다”고 토로하는 이들 중 상당수는 “뭘 그렸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덧붙인다. 데이비드 호크니나 에드워드 호퍼 같은 사실주의 화가, 친숙한 이미지를 사용하는 앤디 워홀 등의 팝아트가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이유는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구체적 형상이 있기 때문이다. 은은한 번짐과 겹침이 보이는 색면추상 화가 마크 로스코나 움직임이 그대로 반영된 액션페인팅의 잭슨 폴락의 경우 형태가 없을지언정 감정과 행위가 표현됐다는 점에서 좀 낫다. 형태도 없으면서 무뚝뚝하고 차갑기까지 한 ‘미니멀리즘’ 예술은 넘어야 할 난해함의 문턱이 높다.
하지만 간결하고 정제된 경향의 미니멀리즘은 20세기 현대미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한 축을 차지했고 오늘날 예술을 넘어 디자인·패션·생활방식 등에 영향을 주고 있다. 관악구 서울대미술관에서 최근 개막한 ‘미니멀 변주’는 이 같은 미니멀리즘에 대한 얘기다. 11명 작가가 내놓은 70여 점 작품은 형식적으로 미니멀리즘일 뿐 각각이 담고 있는 기법과 이야기는 다양하고 교묘하다.
박남사 작가의 ‘회색원’은 무난하고 무심한 회색빛을 띠는 지름 145㎝ 원을 보여준다. 깔끔하다. 아파트나 사무실 어디든 어울릴 것 같다. 그러나 가까이 들여다보면 그냥 칠한 회색이 아니다. 수만 개의 500원짜리 동전으로 이뤄졌다. 10원짜리 동전 이미지로 만든 ‘갈색 사각형’도 멀리서는 미니멀리즘이지만 근접해야 그 본색을 알 수 있다. 엄정한 검은 정사각형의 위엄을 보여주는 ‘검은 사각형의 비밀’은 바로 앞에서 조명을 터뜨려야만 그 아래 깔린 5만원권 지폐들을 볼 수 있다. 순수예술이자 고급예술로서 본질을 지향했던 미니멀리즘 작품들이 미술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는 현실을 풍자하는 듯하다. 12개의 직사각형으로 이뤄진 ‘디지털 검은 사각형’은 전원 꺼진 휴대폰 액정을 확대한 것으로 깨진 화면의 실금도 확인할 수 있다. 형이상학적이기만 하던 미니멀 아트가 현실로 좀 내려오고, 다가선 기분이다.
미술관 입구에 콘크리트 덩어리를 두부 썰듯 잘라 얹은 5.2m 높이의 석탑도 범상치 않다. 전시장 안쪽에는 장식 하나 없이 엄격한 비례만으로 절대미감을 내뿜는 목조 가구들이 선보였다. 스스로 ‘목수’라 부르는 가구 디자이너 이정섭의 설치작품이다. 야외 작품인 콘크리트 탑에는 여기저기 공기구멍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가구들은 검은 물푸레나무가 원래 지니고 있던 옹이와 상처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재료의 결함마저도 그대로 둔 미니멀리즘의 또 다른 시도다.
편대식 작가의 ‘순간’은 폭 54m의 검은색 종이로 벽을 뒤덮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작가는 한지 위에 연필로 선을 긋고 또 그어 이 검은색을 완성했다. 꼬박 1년이 걸렸다. 과거 미니멀리즘은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지만 이 그림은 수행에 가까운 손길 그 자체다.
김이수는 투명테이프에 물감을 칠한 다음 이를 두툼해질 정도로 겹치게 붙여 미세한 ‘차이의 풍경’을 그린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수평선, 때로는 복숭아빛 노을 풍경처럼 보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미니멀 아트를 위장한 ‘모조품’을 만들고자 애쓰는 이은우, 유리면 위에 색을 칠하고 칠한 다음 이를 뒤집어 건 오완석 등 젊은 작가들의 노력은 미니멀리즘이 다 담지 못했던 사회·문화상을 투영한다.
윤동천 서울대미술관 관장은 “품격에 다가서고 절제와 무기교, 섬세함과 치밀함, 고결과 숭고를 보여준 미니멀리즘에 대해 일반인들은 차갑고 몰개성적이며 난해하다고 여긴다”면서 “형식상 미니멀리즘으로 분류할 수 있는 작품들을 한데 모은 이 전시는 동시대 미술에서 새롭게 전개된 미니멀 경향과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의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1월28일까지.
/조상인기자 ccs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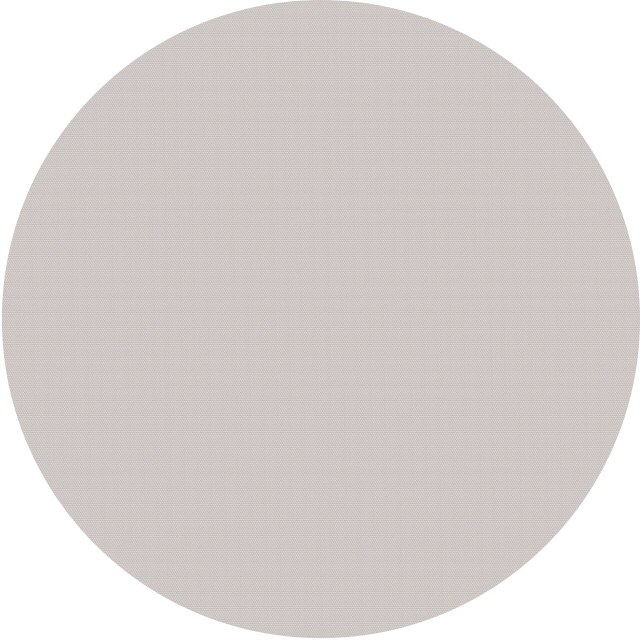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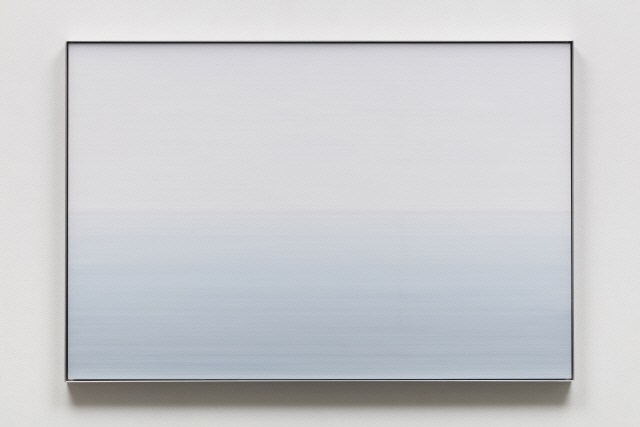



 ccsi@sedaily.com
ccsi@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