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밑동부터 흔들리고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정점에 서 있는 메모리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지적 재산권 지키기에 들어간 미국의 견제로 비메모리 등 반도체 전 분야에서 목표 달성에 차질을 빚는 모양새다. 시장 환경 변화로 선두업체와의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는 냉정한 평가가 나온다.
업계의 한 임원은 “미·중 통상분쟁이 기술 패권 전쟁의 성격이 강한데다 메모리 약세장 진입으로 비용 부담마저 겹치면서 중국의 발목이 단단히 잡혔다”며 “결과론적으로 중국의 반도체 개발 관련 공언이 허언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임원은 “우리 기업으로서는 가장 강력한 잠재 경쟁자의 부상이 밀리는 순기능이 있지만, 중국 경제 침체로 단기적인 반도체 수요 감소에 대비해야 한다”고 봤다.
◇내년 128단 한다더니 3D 낸드 32단 양산도 ‘감감무소식’=중국의 낸드 사업을 이끌고 있는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는 지난해 10월 32단(3세대) 시제품을 내놨다. 그러면서 64단과 90단을 건너뛰고 2020년 128단으로 직행하겠다는 청사진을 언론에 흘렸다. 32단 낸드는 삼성이 지난 2014년 만들었다. 삼성과의 기술격차가 최소 4년가량인 셈. SK하이닉스의 경우 지난해 96단 낸드 개발을 마치고 양산에 들어갔다. 삼성은 올 하반기에 100단 낸드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만약 YMTC가 내년 128단 낸드를 양산한다면 삼성과의 기술격차가 1년 정도로 급격히 줄어든다.
하지만 기술 진척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3D 낸드는 평면구조의 메모리를 수직으로 쌓아올린 것으로 단수가 높을수록 고용량이다. 단수에 따라 △3세대(32단) △4세대(64/72단) △5세대(92/96단) 등으로 구분되는데, 통상 1세대를 건너뛰는 데 1년이 걸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YMTC로서는 이제 개발한 32단 제품으로는 원가경쟁력이 없어 6세대 제품을 이른 시일 내 만들어야 한다는 조바심이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아직 32단 양산도 성공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메모리 전망이 나빠진 상황에서 개발비는 더 늘어나는 구조를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美 ‘집중사수’ D램은 사업 철수설=D램은 난맥상 그 자체다. 양산 시점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꾸 뒤로 밀리더니 급기야 서버용 D램을 주도하고 있는 푸젠진화는 사업 철수설의 주인공이 됐다. D램은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준다. 낸드에 비해 기술 난도도 더 높아 미국은 D램 시장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는 푸젠진화가 지난해 10월 미국 반도체 장비 금수 조치에 이어 올 초 대만 파운드리 업체 UMC와 협력 관계 청산이라는 ‘카운터 펀치’를 연달아 맞은 배경으로 꼽힌다. 삼성이 지난 2011년 양산한 32나노급 D램 시제품을 내놨지만, 양산이 연내 가능할지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중국 메모리 업체 중 기술이 가장 낫다는 모바일용 D램 업체 이노트론도 연내 25나노 모바일 D램 양산 계획에 의문 부호가 붙긴 마찬가지다.
◇사정 나은 시스템 반도체 등 비메모리도 안갯속=메모리 굴기가 휘청거리면서 중국은 어쩔 수 없이 비메모리에 더 치중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칩 설계인 팹리스의 경우 한국 업체는 150개(2016년 기준)이지만, 중국은 1,300개가 넘는다는 통계도 있다. SK하이닉스가 중국 업체와 손잡고 올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중국 우시에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을 건설하기로 한 것도 팹리스 업체가 중국에 많아 일감 수주에 나은 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연내 5세대(5G) 통신용 칩 상용화를 선언한 칭화유니그룹이 최근 미 정부의 압박으로 인텔과의 협력 관계가 틀어진 게 단적인 예다. 칩 양산은 둘째치고 개발마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업계의 한 임원은 “이 사건은 미국의 견제구가 비메모리로 확산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파운드리 중국업체 SMIC도 고전 중이다. 양산 목표 시한인 올 상반기까지 14나노 핀펫 공정의 수율을 못 맞출 가능성이 크다. 미국 업체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를 통해 기술력을 단숨에 끌어올릴 수 있지만, 미국이 좌시할 리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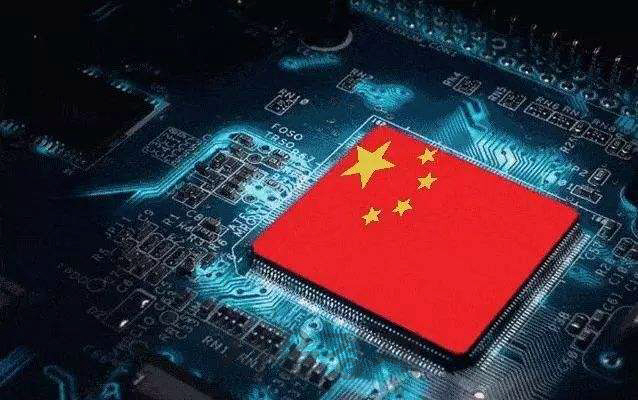
 shlee@sedaily.com
shle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