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1,000만원 이하 긴급대출’을 시작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말 못할 고민에 빠졌다.
소진공은 기존에 해 오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에 한 달 새 11만건의 신청이 몰리면서 심사와 지급까지 두 달이 넘게 걸리자 ‘패스트 트랙’으로 1,000만원 이하 대출에 대해서는 현장서 바로 해 주도록 했다. 긴급경영자금 적체를 풀기 위한 묘안을 낸 것이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시간이 걸려도 7,000만원 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데 긴급 대출은 말 그대로 시급히 대출을 해 주다 보니 심사 등도 패스트 트랙으로 해 규모를 1,000만원으로 줄였다. 이렇다 보니 소상공인들로부터 왜 자금을 줄여서 지원하냐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어 소진공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다.
실제 소진공 한 직원은 24일 “창구에서 소상공인들이 지원자금이 줄었다며 실랑이를 할 가능성이 있어 걱정스럽다”고 토로했다. 사실 코로나19로 매출이 제로가 된 소상공인들은 한달 한달 직원들을 유지하기도 버겁기 때문에 자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해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원금의 규모가 아니라 속도에 정책자금의 성패가 달린 셈이다. 이 때문에 소진공이 1,000만원 이하 대출을 도입하고 전례없이 기간을 단축한 것도 이 같은 이유다. 더구나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자금지원 규모를 줄이는 것도 불가피하다.
하지만 25일부터 이뤄질 대출 창구에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일부에서는 가수요가 마스크 품귀 사태를 키운 것처럼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소상공인들도 정책자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 때문에 일단 신청해 놓고 보자는 심리가 작용해 ‘가수요’가 부풀려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전 국민이 금 모으기에 나서 조기에 위기를 극복했던 것처럼, 지금 소상공인들에게도 ‘더 급한 소상공인’을 위해 양보하는 절제된 시민의식이 필요해 보인다. 소상공인 스스로가 정책자금에 대한 가수요를 진정시켜야 진짜 자금이 급한 이웃 소상공인들이 살아날 수 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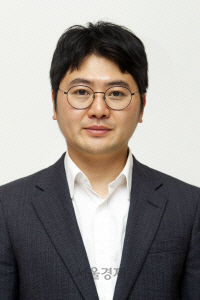
 ggm11@sedaily.com
ggm11@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