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0월 손실보상 시행에 따른 재원으로 2조~3조 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3분기 손실보상 용도로 1조 원을 마련해놓은 점을 감안하면 보상 세부 기준 확정 방향에 따라 최대 2조 원이 부족해지는 셈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짜던 지난 6월까지만 해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 것으로 보고 관련 예산을 6,000억 원만 잡아뒀으나 7월 이후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부랴부랴 4,000억 원을 증액해 1조 원을 맞춰둔 상태다. 하지만 ‘짧고 굵게’ 시행하겠다던 거리 두기 조치가 석 달째 이어지면서 관련 예산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정부 내부에서는 ‘3차 추경’까지 가는 일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달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해 손실보상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기정예산(이미 확정된 예산)이나 예비비를 활용해 지원하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단 홍 경제부총리가 말하는 기정예산에 불필요 예산을 줄이거나 옮겨 쓰는 지출 구조 조정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미정이다.
이에 앞서 예산 업무를 총괄하는 안도걸 기재부 2차관도 지난달 말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현재 3차 추경 편성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기정예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관련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예산의 20% 이내에서는 정부가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할 수 있어 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일종의 빚을 내 지갑을 여는 ‘국고채무부담행위’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수해 복구를 위해 9년 만에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시행한 바 있다.
문제는 거리 두기 조치가 계속될 경우 매년 10조 원에 이르는 돈이 손실보상에 쓰이게 돼 국가 재정에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부채의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게 현재 우리나라 재정의 가장 큰 문제”라며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단순 현금을 지원하기보다 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등 다른 대책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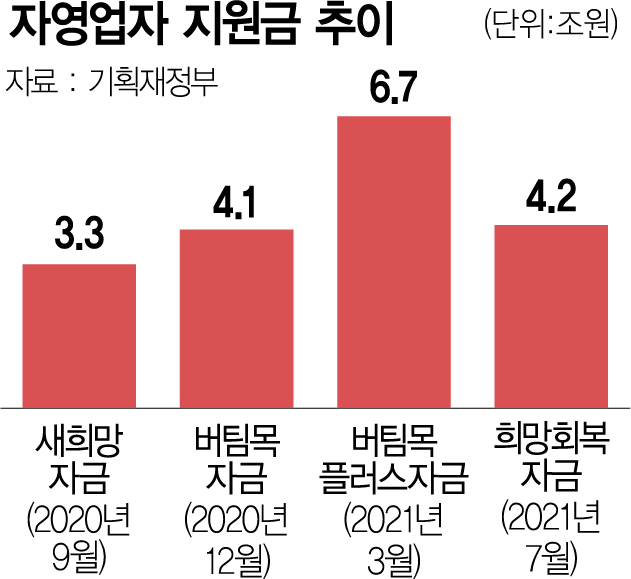
 squiz@sedaily.com
squiz@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