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을 먹을 지 모르지만 어떤 단란한 가정이 산책하는 모습을 보노라면 ‘작별의 공동체’가 걸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겪어보니 가족이란 너무나 슬픈 작별의 공동체입니다.”
김혜순 시인은 14번째 시집 ‘지구가 죽으면 달은 누굴 돌지?’ 출간을 기념해 28일 서울 서교동 문학과지성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김 시인은 제도화된 지배적 언어에 맞서 몸의 언어로 한국 현대시의 미학을 갱신해와 ‘시인들의 시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작가는 한국인 최초로 2019년 그리핀 시 문학상, 2021년 시카다상을 받았고 해외에 가장 많이 소개된 시인이다.
이번 시집은 엄마의 아픔과 죽음으로 인한 비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전 인류적 재난을 맞이한 시대적 절망, 죽음의 바깥에서 텅 빈 사막을 헤맨 기록을 담았다. 이를 통해 죽음이란 ‘삶 속에서 무한히 겪어나가야 하며 무한히 물리쳐야 하는 것, 살면서 앓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김 시인에게 시란 불행을 더 불행답게, 슬픔을 더 슬픔답게, 파괴를 더 파괴답게 하는 존재이다. 타인을 위로하는 것은 수필이나 산문의 영역이라고 본다. 그는 “코로나에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파고가 우리한테까지 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두면 지구가 큰일 나겠다 싶었다”며 “엄마의 죽음을 겪으면서 비탄의 연대랄까, 불행의 전체적인 번짐이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기도보다 비탄하는 것이 시인의 역할이라는 생각 속에 시가 탄생했다”고 설명했다.
김 시인은 1979년 데뷔 이래 ‘엄마’를 주제로 시를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엄마는 저의 과거였는데 돌아가심으로써 미래가 됐다”며 “나에게 삶만 준 줄 알았더니 죽음도 줬다”며 “엄마에 ‘관해서’, ‘대해서’ 쓴 것이 아니라 그저 사라지고 있는 엄마와 함께 시 한편을 생성한 것”이라고 말한다. 김 시인은 엄마의 죽음 이후 그 충격에 응급실에 3번이나 실려가고 “산산이 부서지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아팠다고 한다. 최근에는 코로나에 걸렸다.
그는 “정신적인 고통은 서로 소통할 수 있지만 육체적 고통은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 엄마의 죽음과 개인적 아픔을 겪은 뒤 작가가 향한 곳은 시간이 파편화된 공간, 바로 사막이다. 시인은 “작별의 공동체라는 시간과 공간은 어디로 가는 걸까 싶었고 그곳으로 가고 싶었다”며 “사막은 사랑의 재를 태우고 난 자리, 우리의 시간들이 사라진 자리, 우리가 소통할 수 없는 자리”라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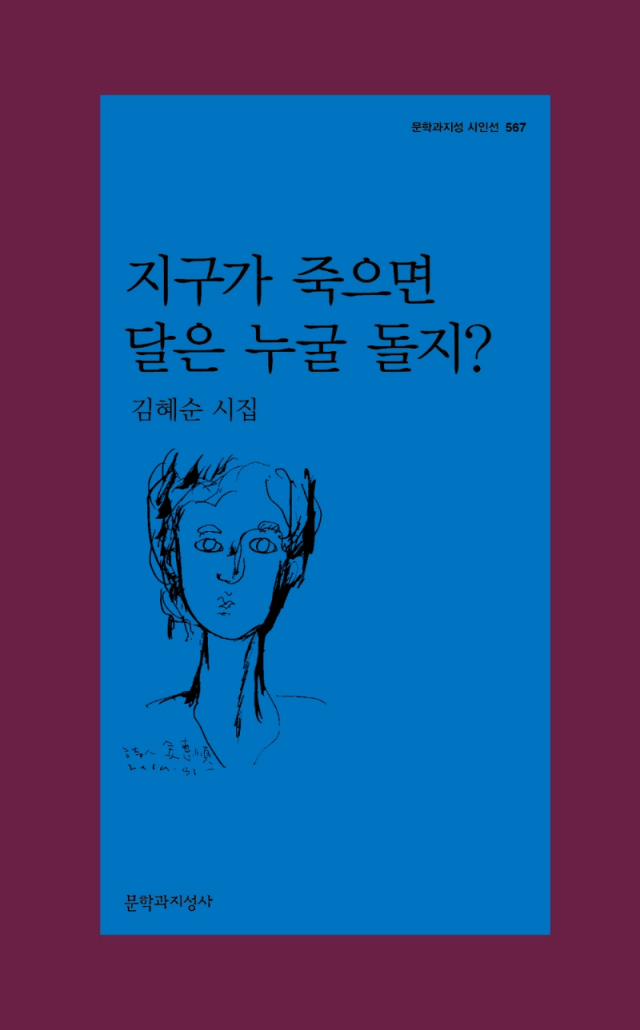
 choihuk@sedaily.com
choihu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