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올해 최대 30조 원에 이르는 최악의 적자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와 한전 안팎에서 영구채(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지원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한전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영구채를 찍어내 이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인수하면 재무 건전성 위기를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2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한전 자구안을 토대로 별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전이 제출한 자구안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실효성을 우선 검토하고 이어 한전이 구조적으로 적자를 내는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과 금융 지원 방안이 각각 별도 트랙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업계는 영구채 발행이 금융 지원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구채는 원칙적으로 만기가 없어 회계상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현금 유입은 물론 재무 건전성도 개선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같은 장점 때문에 일반 기업들은 물론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들도 영구채를 발행해 재무를 개선하는 효과를 누려왔다. 이에 앞서 아시아나항공이나 HMM 등 한계기업들도 영구채를 발행해 경영위기를 극복한 바 있다.
일단 재무 건전성이 개선되면 사채 발행이 더 유리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한전은 한전법에 따라 회사채 발행 한도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 이하'로 묶여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한전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금액은 약 46조 원이지만 올해 1분기에만 8조 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내면서 적립금이 감소하는 상황이다. 반면 지난해 기준 한전의 누적 발행 사채는 연결기준 총 74조 386억 원에 이른다. 한전이 올해만 15조 원의 사채를 발행하면서 회사채 시장을 흔드는 것도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다만 영구채가 장점만 가진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영구채는 '비싼 채권'으로 통한다. 사실상 만기가 없는 대신 연 금리가 일반 회사채에 비해 1%포인트가량 비싸고 이마저도 3~5년 뒤에는 금리가 인상(스텝업)되는 구조로 상품이 설계돼 조기 상환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2013년 한국가스공사가 영구채 발행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내놓았을 때도 "실질적으로 이자 부담만 더 증가하는 구조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 때문에 국책은행이 영구채를 인수할 경우 금리를 어느 정도 낮춰줘야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투자은행(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정부의 보증을 받는 한전이 영구채까지 찍어야 할 정도라면 내부 경영이 심각하게 곪았다는 이야기"라며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 동시에 한전 자구안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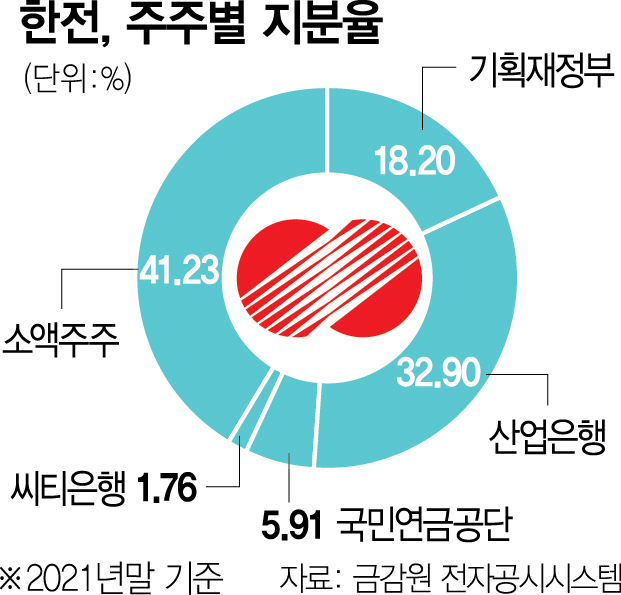
 squiz@sedaily.com
squiz@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