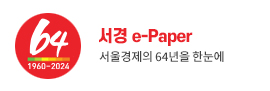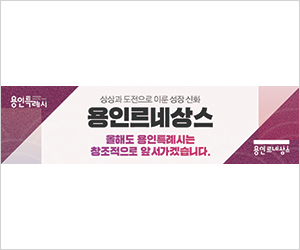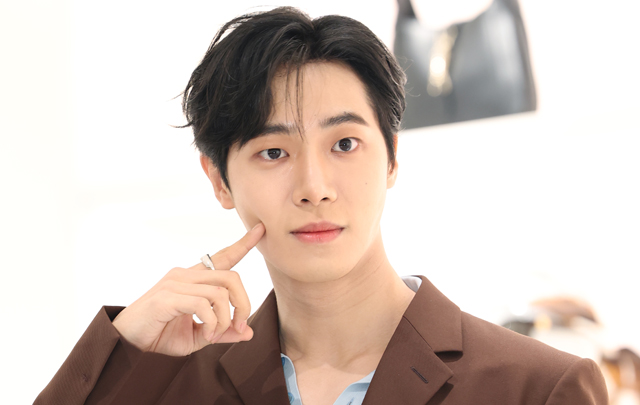정부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 가구 발굴 기준을 기존 34개에서 39개로 확대한다. 또 주거지와 연락처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위기 가구를 실종자·가출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소재를 파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취약 계층의 소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일어난 ‘수원 세 모녀’의 비극이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은 24일 간담회를 열고 관련 부처 및 학계 전문가들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 가구 발굴 시스템에서 입수하는 위기 정보를 기존 34개에서 중증 질환 신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 등급, 맞춤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세대원 정보를 포함해 39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9월부터 시행되는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개통과 맞춰 복지 멤버십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한다. 복지 멤버십은 가구원의 출산·사망, 소득·재산 변동 등이 발생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로 이를 바탕으로 취약 계층이 복지 서비스를 받기 용이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단순히 조사 대상 확대 등으로는 복지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세 모녀’ 역시 위기 정보 대상자에 포함됐지만 기준 중 건보료 체납만 해당돼 집중 관리를 받는 중앙 복지 위기 발굴 대상자로는 선정되지 못했다.
5월부터 시행한 3차 조사에서는 위기 정보 입수자가 총 544만 1000명에 달했지만 이 중 중앙 복지 위기 발굴 대상자는 12만 3000명에 그쳤다. 중앙 복지 위기 발굴 대상자도 두 달마다 복지 담당 공무원이 점검해야 하는 만큼 복지 사각지대를 완전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조 차관은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개인정보 연계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개선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발견하기 어려운 취약 계층을 집중 발굴해 적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