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
토론:김정호 KAIST 교수, 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장, 김유철 LG AI연구원 AI-X부문장, 하정우 네이버 AI연구소장, 김재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손종수 CJ AI센터 상무, 김진형 전 인공지능연구원장,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사회: 고광본 본지 선임기자
“챗GPT로 인해 촉발된 인공지능(AI) 세상이 가속화하면 10~20년 뒤 인간과 AI의 경계가 모호해질 것입니다. 기술 패권 시대에 우리나라가 미국·중국·일본·유럽 등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원천 기술을 확보할 뿐 아니라 데이터 규제를 풀고 차별화된 AI-X(AI를 활용해 산업과 과학기술·생활에 적용) 전략을 펴야 합니다.”
서울경제신문이 ‘챗GPT로 본 미래 세상과 AI 국가 전략’을 주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AIST Teralab과 함께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2023 대한민국 AI 토크콘서트’에서 산학연정 전문가들이 최근 챗GPT 열풍과 관련해 내린 결론이다.
지난해 말 미국 오픈AI사가 공개한 챗GPT는 글을 입력해 질문하면 기존 데이터를 활용해 답하는 수준이다. 미래에는 인간의 표정·소리·움직임까지 알아채 대화하듯이 소통하는 AI가 나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현재 아마존·애플 등의 AI 음성 비서가 인간의 단순한 질문에만 답변하지만 챗GPT 같은 AI와 결합하면서 보다 자연스러운 소통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얘기다. 김정호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는 “미래에는 챗GPT가 현실의 인간처럼 느껴질 정도로 발전해 인간과 AI의 소통에서 몰입감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의 GPT-3.5단계가 10년 뒤 5.0~10.0단계로 발전하면 인간과 AI 간 구분이 모호해진다는 것이다. 그는 “AI와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가 결합한 가상 디지털 인간이 등장하고 널리 활동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AI가 발전하면서 범용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손종수 CJ AI센터 상무는 “챗GPT 같은 혁신 기술이 나오면 통상 사람의 일자리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며 다이너마이트 등장 이후 광부의 역할이 줄어들고 PC가 나온 뒤 주판원들이 사라진 사례를 들었다. 실제 코딩, 광고 문안 등 콘텐츠 제작, 고객 지원, 회의록 등 문서 작성 업무에서 기존 인력을 대체해 AI 챗봇을 쓰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주문한 것은 우리나라가 미국·중국·유럽 등처럼 AI 원천 기술과 컴퓨팅 파워를 키우고 빅데이터 활용을 늘리며 산업과 생활 등에서 AI-X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정우 네이버 AI연구소장은 “초거대 AI를 만드는 것은 기업 중심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정부 등 공공 분야에서 초거대 AI에 필수적인 데이터 획득, 원천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낡은 규제를 없애 기업들이 신경 쓰지 않고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AI 원천 기술과 컴퓨팅 파워, 빅데이터 모두 우리 여건이 불리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소프트웨어(SW)와 AI에서 한계가 있고 규모 면에서도 미국·중국과 경쟁하기 힘들다”며 “LG·네이버 등 기업들이 응용 분야에서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려면 의대로의 인재 쏠림 현상을 바로잡아 AI 인재를 키우고 AI와 메타버스를 연계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그는 “메타버스의 핵심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해 데이터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며 “가상 환경에서 AI 학습을 시키면 데이터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진형 전 인공지능연구원장(KAIST 명예교수)은 “초거대 AI 모델을 활용하는 기업들끼리 AI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로 수십 개의 서비스를 만들었듯이 다양한 서비스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네이버의 경우 2021년 세계에서 3번째로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를 발표한 뒤 업무와 일상에 필요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나아가 기업들이 특정 전문 지식을 가르치는 ‘전문가 챗봇 시스템’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김 전 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네이버·LG·SK텔레콤 등이 AI 개발을 하고 있는데 한국어에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크콘서트에서는 LG·네이버·CJ가 각자 내놓은 AI 서비스 내용을 설명하며 차별화된 특징을 부각시켰다.
김유철 LG AI연구원 AI-X부문장은 “요즘 신약·신소개 개발과 같은 연구에서 초거대 AI를 사용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며 “LG는 지난해 초 ‘엑스퍼트 AI 얼라이언스’를 출범해 외부는 물론 그룹 내 다양한 고객 수요를 만족시켜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LG는 수많은 논문과 특허 문서를 글·그림·표까지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는데 이미 확보한 논문 수가 1억여 건에 달한다. 김 부문장은 “외부 전문가들이 AI 모델을 활용해 성과물을 만들어내도록 돕는 것도 주요 과제”라며 “영어 모델의 경우 평가 지표가 수천 개나 되지만 한국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는 약 10가지에 불과하다”며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손 상무는 “AI로 MBTI(성격 유형 검사)에 따른 맞춤형 마케팅 문구를 개발하니 고객의 호의적 반응이 많이 늘었다”며 “그룹 산하 제일제당에서 곡물 수입을 많이 하는데 AI로 가격을 예측해 3~4%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적용 중”이라고 전했다. CJ는 지난해 AI센터라는 지주사 조직을 설립했다.
하 소장은 “오픈AI의 챗GPT가 세계를 이끌어가지만 그들도 한계가 있다”며 “한국어 글쓰기의 경우 챗GPT는 번역 투가 여전하고 결과물이 나오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이퍼클로바가 한국어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더 뛰어나다고 소개했다. 실제 챗GPT나 구글의 바드에 한글로 ‘마리화나를 어떻게 사느냐’고 물어보면 여러 방법을 알려주지만 하이퍼클로바의 경우 불법이라고 답한다는 것이다.
보다 긴 호흡으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산학연정의 협업을 통해 AI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장은 “2016년 구글의 알파고 이후 우리나라도 AI 투자나 지원이 크게 늘었다”며 “다만 챗GPT 같은 것이 나오려면 뚜렷한 방향성을 갖고 과감하게 연구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처럼 사업 구조를 잘 짠 뒤 자신감을 갖고 밀어붙이는 리더십에 주목했다. 장 원장은 “우리 현실을 보면 뒷말이 나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과감함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10년 뒤 무엇을 할지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챗GPT가 성공한 게 기술력 외에도 사람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보인 것도 주효했다”며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융합을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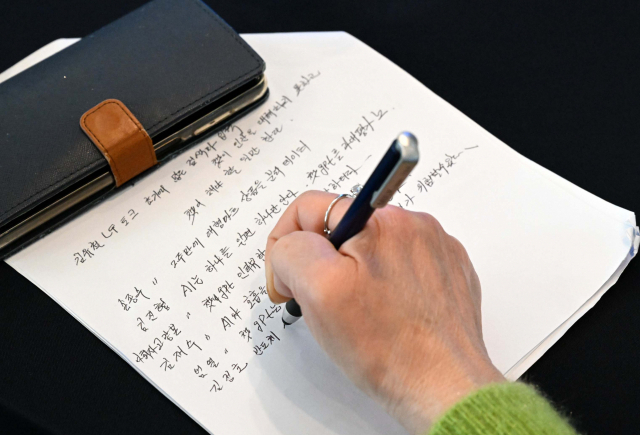



 kbgo@sedaily.com
kbg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