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 20년간 꾸준히 지적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축소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강화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거시 건전성 규제로도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으면 금융 안정을 고려해 금리를 인상하는 ‘건전성 고려 통화정책’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소속 이경태 부연구위원과 강환구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장기구조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영향 및 연착륙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심화된 문제인 만큼 디레버리징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완만하게 하락한 주요국과 반대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0%로 스위스·호주에 이어 3위다. 2010년 14위에서 불과 12년 만에 3위로 올라섰다. 당장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더라도 장기 성장세를 제약하고 자산 불평등을 키우는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점진적인 디레버리징이 필요하다.
연구진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급증한 원인으로 ‘가계대출의 높은 수익성과 안정성’ ‘차주 단위 대출 규제 미비’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자산 수요 증가’ 등을 꼽았다. 은행 입장에서 기업대출보다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가계대출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자본 규제도 이를 부추겼다는 것이다. 또 미국·캐나다 등 주요국이 2012~2014년 DSR 규제를 도입한 반면 우리나라는 2019년 12월이 돼서야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마저도 전세자금대출, 이주비·중도금대출, 상용차 금융, 1억 원 이하 신용대출 등 예외가 많다. 저금리 기조 역시 집값 급등의 배경이 됐다고 지목했다.
덴마크·노르웨이 등 주요국이 가계부채를 100% 미만으로 줄이는 데 18년이 걸린 만큼 우리도 디레버리징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명목 GDP 성장률을 4%라고 가정했을 때 가계부채 증가율을 3% 정도로 관리한다면 2039년이 돼야 90%로 떨어진다.
연구진은 이를 위해 가계 부문의 경기 대응 완충 자본 강화, 전세대출 보증 한도 축소, DSR 강화 등 거시 건전성 규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수준별로 차등 금리를 적용할 뿐만 아니라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의 대출에 대해서도 가산 금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부연구위원은 “당장 DSR 예외 대상을 축소하면 신용 경색이 일어나기 때문에 큰 로드맵 차원에서 원칙적인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거시 건전성 규제 효과가 제약되면 경기 호황 시 자산 가격 급등에 대해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는 ‘건전성 고려 통화정책’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완화적 통화정책이 과도한 레버리지 활용과 위험자산 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실장은 “그동안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동시 목표로 추진했는데 가계부채나 부동산 불안 가능성이 있을 때는 금융 안정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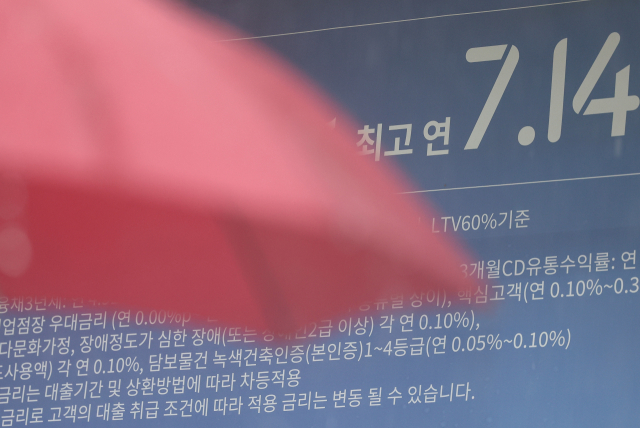

 jw@sedaily.com
j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