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선전(深?) 경제특구가 지정된 후 전 세계 주요 기업의 공장이 중국으로 몰렸다. 낮은 임금과 풍부한 노동력, 그리고 거대한 소비 시장마저 갖춘 중국은 기업들에는 너무 매력적이었다. ‘세계의 공장’ 중국의 효과는 지대했다. 값싼 의류, 잡화와 같은 공산품은 물론 양질의 가전제품까지 중국이 공급하면서 전 세계는 2000년대에 인플레이션 없는 성장, ‘골디락스’도 경험했다.
선진국 대부분은 ‘차이나이펙트(china-effect)’를 향유했다. 자동차·기계 산업에서 프리미엄 지위를 갖는 독일, 소재·부품 강국 일본 , 항공·화학·패션의 우위를 갖는 프랑스, 금융·에너지·바이오의 영국 등이 중국의 등에 올랐다. 이웃 국가 한국도 중간재·소비재 수출로 중국 효과를 톡톡히 봤고 미국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이런 탓에 ‘세계의 공장’ 중국의 지위가 흔들릴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은 소수였다.
오죽하면 중국이 15년간 끈질기게 원했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미국이 2001년에 후원했겠는가. 미국은 그들이 바라는 대로 세계의 공장, ‘기술 중진국’의 지위를 갖는 중국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고 봤을 것이다.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2000년 3월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우리 상품을 더 많이 수입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경제적 자유’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면서 그런 기대를 드러냈다. 그는 심지어 “인터넷 발전과 맞물려 중국이 미국처럼 변모할 것”이라고도 봤다.
강산이 채 두 번 바뀌기 전에 미중의 밀월은 끝났다. 시진핑이 중국몽(夢)의 발톱을 내밀었는데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 미국마저 넘어선 초강대국이 되는 게 목표였다. 미 정부는 버락 오바마 정부 말기부터 진영을 막론하고 도널드 트럼프 및 조 바이든 정부를 거치면서 대중(對中)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늦었지만 예봉을 꺾겠다는 것이다. 논란 속에 지난해 8월 시행한 반도체지원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그 정점에 있다. 수백조 원의 보조금을 무기로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의 수출을 막고 중국의 배터리·전기차 주도권을 뺏겠다는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확실한 성과를 거뒀다. 두 법안 발효 1년여 만에 반도체·전기차·배터리 회사의 대미 투자는 3000억 달러에 육박했다(니혼게이자이). 우리 기업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럽 19건, 일본 9건, 캐나다 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반대로 쉼없는 성장을 해왔던 중국 경제는 40여 년 만에 흔들리고 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중국을 방문해 “기업들로부터 중국이 너무 위험해져서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점점 더 많이 듣는다”고도 직격했다. 사실상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로 중국은 여러 위험 신호가 넘친다. 수출이 줄고 해외투자도 급감하고 있다. 부동산은 복합 금융위기를 촉발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느낄 정도로 좋지 않다. 성장률은 고꾸라졌고 청년 실업률도 20% 안팎이다. 생산·투자·소비의 3축은 물론 금융 부문에서도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버텨낼 것이라는 시각과 리먼 브러더스 사태보다 더 큰 퍼펙트 스톰이 중국을 덮칠 것이라는 시각이 맞서고 있다.
중국을 배제시키는 공급망의 재편에 국가별 희비도 갈렸다. 일본이 부상한 반면 독일·한국은 휘청이고 있다. 중국·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독일은 역성장을 전망할 정도다. 비교적 수출 포트폴리오가 잘 짜여 있는 우리의 경우 대중국 수출이 1년 넘게 감소했지만 미국·유럽연합(EU)·중동으로의 수출이 늘면서 상쇄하고 있다. 반도체가 급감하자 자동차·조선·방산 등이 일부 메우면서 반등을 노리고 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위기를 직감한 정부와 기업이 발 벗고 뛰고 있지만 정치권만은 그들의 늪에 빠져 있다. 난데없는 이념 대결을 벌이고 과학을 믿지 못한 채 후쿠시마 오염수 갈등만 확산시키고 있다. 방패가 될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은 지지부진·생색내기뿐이다. 시선은 오직 총선과 공천을 향하고 여당은 용와대, 야당은 당 대표의 발표만 쳐다보고 있다. “발목만 잡는, 딴 세상 정치가 가장 걱정”이라는 한탄이 울려 퍼질수록 정치 불신을 넘어 국가 소멸의 속도도 빨라진다는 것을, 이제는 직시해야 하지 않겠는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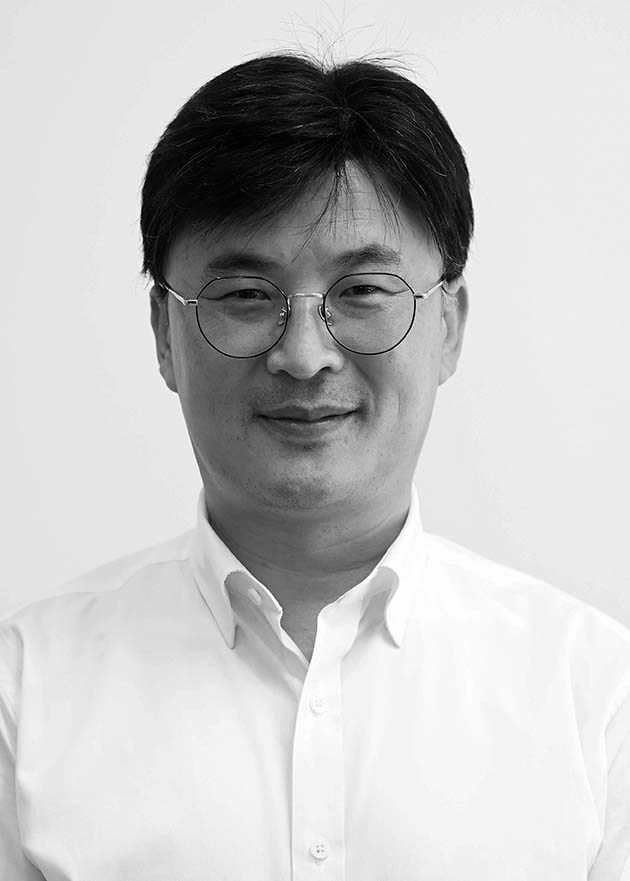
 fusioncj@sedaily.com
fusioncj@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