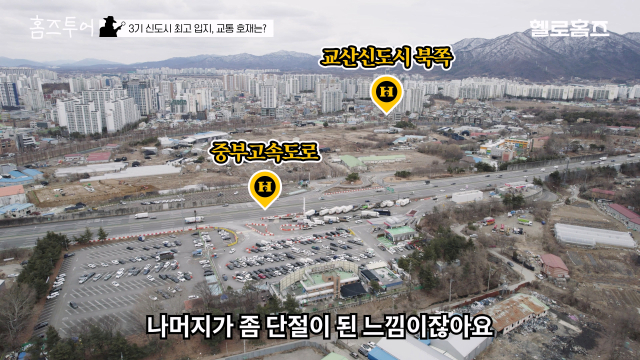정부가 2월 들어서도 연간 부동산 정책 대출 공급 목표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정책 대출의 파급효과를 놓고 부처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이를 조율할 ‘컨트롤타워’마저 탄핵 국면 장기화에 제 역할을 못하면서 진통이 길어지고 있다. 가계대출 총량을 좌우하는 정책 대출 공급액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시중은행의 대출 관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올해 부동산 정책 대출 공급 규모를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통상 매년 1월까지는 부처 간 조율을 마치고 연간 공급액을 확정했으나 부처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정책 대출은 디딤돌·버팀목대출 등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지난해에는 연 55조 원 규모로 공급됐다.
금융 당국은 대규모 정책 대출이 또다시 풀리면 연쇄 매매를 부추겨 전체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만큼 공급액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외곽에서 시작해 서울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로 이어지는 주택 갈아타기의 마중물로 정책 대출이 남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거래가 늘수록 전체 집값이 뛰어 잠잠했던 대출 수요마저 다시 불붙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다고 당국은 우려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며 정책 대출을 예년 수준으로 일관되게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금융 당국은 정책 대출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향후 은행의 손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걱정하고 있다. 정책 대출 구조를 보면 은행은 정부를 대신해 저금리로 대출을 먼저 내주고 정부는 시중금리와 정책 상품 간 금리 차이를 감안해 이자를 일부 보전해준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현재 금리가 연 2.65~3.95%다. 정부가 최대 0.99%포인트까지 이자비용만 대신 부담해주는 형태다.
반면 국토부는 은행이 자발적으로 정책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정책 대출로 인한 손해가 크지 않다고 반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은행이 정책 대출을 취급해 손실을 보고 있다면 안 팔면 된다”면서 “정책 대출 수탁은행을 모집할 때 입찰 경쟁까지 벌어지는 판인데 은행이 밑지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부처 간 협의가 지연되는 데는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경제정책 리더십 공백이 커진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데다 부처를 총괄해야 할 기획재정부마저 조율을 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것이다. 이번 논의에 관여하는 정부 인사는 “예전에는 부처 간 의견이 이 정도로 좁혀지지 않으면 대통령실이 나서 가르마를 타줬는데 지금은 상황을 정리해줄 곳이 없다”면서 “기재부라도 대신 나서줘야 하는데 온갖 일이 몰리다 보니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문제는 부처 간 합의가 지연될수록 가계대출을 정밀하게 관리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정책 대출 증가액(잔액 기준)은 지난해 39조 4000억 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정책 대출+시중은행 대출) 증가분의 94.7%를 차지한다. 가계대출을 좌우하는 정책 대출 규모가 결정되지 않으면 당국으로서는 은행 대출을 어느 수준으로 관리할지 정하기 쉽지 않다. 은행 입장에서 보면 언제든 대출 정책을 바꿔야 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안은 채 한 해 영업을 시작하게 된 셈이다. 한 시중은행 여신 담당자는 “연간 대출 계획을 잡을 때 정책 대출 규모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책 대출이 얼마나 불어날지 모르니 자체 상품 공급 규모를 가능한 한 보수적으로 잡아뒀다”고 말했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ubo@sedaily.com
ub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