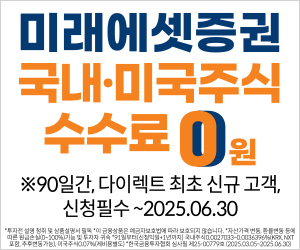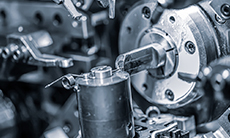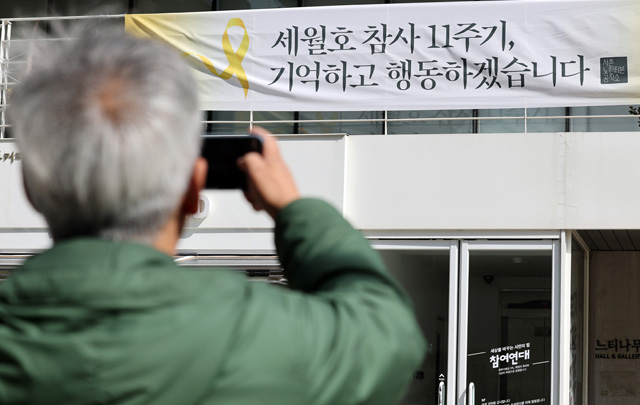“국내 투자자는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만든 상장지수펀드(ETF)에만 투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만든 금융 상품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돈이 해외로 흘러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한국에서도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가 가능해진다면 관련 시장에 대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부 유출도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세일(사진) 신한투자증권 블록체인스크럼 부서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신한투자증권 본사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한국은 가상자산 거래량이 매우 높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에서 비트코인만 사고파는 1차원적인 투자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서장은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이 가장 쉽게 결합할 수 있는 분야가 ETF라고 진단했다. 국내 ETF 시장 규모가 200조 원을 바라볼 정도로 투자 시스템이 성숙화돼 있는 만큼 가상자산을 금융 상품화하기 위해 가장 수월한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또 투자 편리성이 높고 손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아 ETF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가 높은 점도 긍정적인 요소다. 그는 “현재 한국 시장에서 가상자산은 금융 상품화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 과정이 번거로운 측면이 있다”며 “ETF라는 전통적인 매개체에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자산을 결합하는 게 사업적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최근 웨이브릿지, 파이어블록스와 비트코인 현물 ETF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신한투자증권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지정 참가 회사(AP) 및 유동성 공급자(LP), 웨이브릿지는 가상자산 시장 프라임 브로커(Prime Broker), 파이어블록스는 비트코인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수탁 기술 제공자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물론 금융 당국은 여전히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근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에 나서는 등 이전보다 규제가 완화되고 있지만 해외에 비해서는 아직 뒤쳐져 있는 상황이다.
이 부서장은 이런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7, 8년 전만 하더라고 한국의 블록체인 산업이 그 어느 나라보다 활성화돼 있었지만 규제로 인해 성장이 더뎠다”며 “금융 산업 자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과의 연계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국 뿐만 아니라 일본, 동남아시아, 아프리카까지 블록체인 기반 금융 시장이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라면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한국이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면 금융 서비스가 새롭게 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 부서장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한 금융 상품이 전통 금융 서비스를 완전히 대체하거나, 혹은 시장에서 승기를 잡을 것이란 이분법적인 생각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두 분야가 모두 ‘특정 자산에 투자를 한다’는 기본적인 구조가 비슷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부서장은 “가상자산과 전통 자산 모두 사람들이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한다는 점에서 ‘가치 창출’이라는 동일한 니즈를 충족하고 있다”며 “비트코인 매매, 탈중앙화 금융(DeFi·디파이) 등 이미 전통 금융 시장에 존재하던 투자 방식인데 자산의 성격만 변한 것”이라고 짚었다.
두 자산의 유일한 차이점은 금융 비즈니스가 이뤄지는 시스템 뿐이라는 게 이 부서장의 설명이다. 그는 “컴퓨터의 발전을 통해 1970년도에 전자 증권 거래가 도입된 것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투자 시스템이 생긴 것”이라며 “각각의 시스템에서 진행되는 ‘투자’라는 비즈니스는 똑같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ate@sedaily.com
kat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