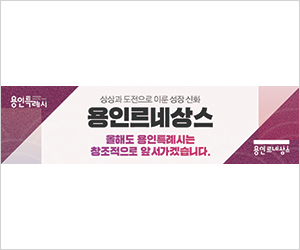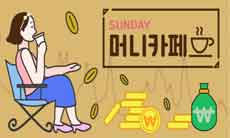국내 연구진이 한라산의 미생물 흔적을 토대로 4200년 전 현지 기후를 정밀 분석하는 데 성공했다. 새로운 분석법은 과거 기후뿐 아니라 앞으로의 전 세계적 기후변화 예측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조아라 박사 기후변화대응연구본부 박사 연구팀이 한라산 사라오름에서 채취한 퇴적층 시료의 규조류를 분석해 과거 홀로세 동안의 기후변화 복원에 성공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통해 4200년 전 제주도의 기후를 분석하고 당대 세계적인 이상기후 사건과의 유사성도 규명해냈다. 연구성과는 국제 학술지 ‘고지리학, 고기후학, 고생태학’ 이달호에 게재됐다.
규조류는 규산질 껍데기를 가진 식물성 플랑크톤이다. 환경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 과거 기후를 이해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메소포타미아와 인더스 문명 쇠퇴 등을 일으킨 가뭄, 홍수 등 이상기후의 증거 역시 규조류 분석을 통해 발견된 바 있다. 지질연이 한라산에서도 유사한 분석을 통해 한국과 동아시아의 과거 기후 복원에 성공한 것이다.
연구팀은 사라오름 습지에서 최대 10m 깊이의 미고결 퇴적층과 화산쇄설물의 표본을 추출해 방사성 탄소 연대를 측정하고 조류 군집을 분석했다. 그 결과 4200년 전 제주도에서 모래 입자 퇴적물과 부유성 규조류가 급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당시 제주도에서 폭우와 강수량이 증가했다는 의미로 기존에 제주도가 매우 건조한 기후였다는 가설을 뒤엎는 것이다.
연구팀은 또 중위도 지역 대류권 상층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강하게 부는 바람인 서풍 제트의 남하와 제주도 강수량 증가가 관련이 있음을 확인했다. 제주도를 포함한 특정 지역에서는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하고 다른 지역은 극심한 가뭄을 겪는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과거 기후와 규조류, 서풍 제트의 관계 분석을 통해 미래 기후변화 역시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제주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장기적 기후변화 패턴을 연구할 예정이다.
조 박사는 “이번 연구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다리가 돼 기후 위기에 대한 해답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후 변화 예측 모델 고도화와 글로벌 연구 협력 강화를 통해 미래 기후 예측의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ookim@sedaily.com
soo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