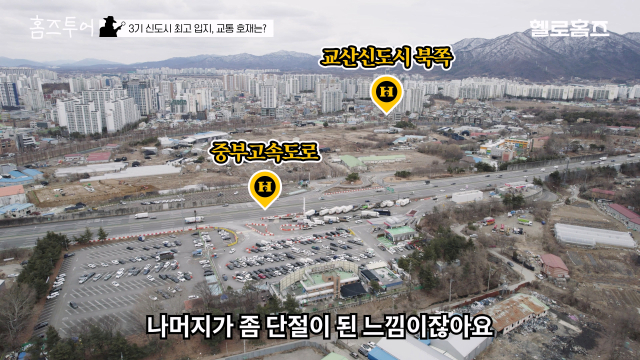지난주 서울경제신문의 ‘인공지능(AI) 정부로 가자’ 시리즈가 처음 보도된 후 예전부터 알고 지낸 한 전직 경제 관료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는 “현 정부조직법 체계에서는 데이터가 부처 간 장벽에 막혀 있다”며 “AI 정부로 가려면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데이터와 AI 정부의 관계가 그렇다. AI는 데이터를 먹고 자란다. AI가 아무리 정교한 알고리즘을 짜고, 뛰어난 연산 능력을 기반으로 정책을 설계해도 고품질의 데이터 없이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AI 정부로 가기 위해서는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 데이터가 자유롭게 흘러야 한다. 그런 면에서 지금 정부의 데이터 활용은 아쉬운 대목이 많다. 기획재정부가 2007년부터 도입해 운영 중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이 대표적이다. 세입과 예산 편성, 집행·결산·평가 등 일련의 재정 활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제공하는 시스템이지만 부처와 업무 범위, 직급에 따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다르다. 예산·재정을 책임지는 기재부 내에서도 데이터 접근은 제한적으로 이뤄진다고 한다. “재정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오히려 중앙집권적 구조를 상징하는 시스템이 돼버렸다”는 자조 섞인 평가가 내부에서도 나올 정도다.
물론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다. 중앙 부처에 쌓이는 데이터들은 국민 개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기 마련이다. 늘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안고 있다. AI를 활용해 국민들에게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백번 제공해도, 단 한번의 실수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 책임 소재에 민감한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알고도 실행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이런 이유가 데이터의 흐름을 가로막는 절대적인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된다. 데이터가 자유롭게 흐르지 못하는 배경에는 데이터를 소유의 개념으로 보는 ‘관료주의적’ 시각이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직무처럼 데이터도 경계와 영역의 관점에서 바라봐서는 안 된다. 구슬도 잘 꿰어야 보배가 되듯이 부처 간 데이터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공직 사회의 인식 전환이 절실한 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gaghi@sedaily.com
ingagh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