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것이 작은 것을 지배하는 인간사. 시장이나 기업의 세계에서도 큰손이 큰 소리를 친다. 주력 기업이 위에 있고 작은 협력 기업들은 오징어 다리처럼 밑에 붙어 있다. 수직적 의존 구조. 그러나 산업계의 진화가 계속되면서 기업 간 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큰 것이 작은 것을 그냥 무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기업간거래(B2B)나 공급망관리(SCM), 오픈 이노베이션은 변화의 단초였다. 그다음 기업, 고객, 정부 기관, 기술 인력, 소비자 등이 유기적으로 복합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업 생태계가 중시됐다. 산업마다 특수한 생태계가 발견됐다. 이 과정에서 작은 것이 그냥 ‘삐약’이 아님이 밝혀지고 있다.
대부분의 산업 초기에는 원청 기업이 하청 기업에 지시하고 특정 부분을 맡긴다. 말 잘 듣는 중소기업을 선정해 단순 순종형 생태계를 만들었다. 시방서와 설계도의 세세한 부분까지 하청 업체에 넣어주고 공임에 약간의 이윤을 더해 납품가를 주는 방식, 거기서 작은 것은 그냥 삐약이었다. 그런데 이런 수직적 체제는 주력 기업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웠다. 그마저도 강력한 경쟁 세력의 등장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수직적 계열화와 위계 중시형도 있지만 기업 연합체와 같은 수평형도 나타났다. 기술력을 보유한 작은 협력 기업이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생태계에 질적인 변화가 나타난 분야가 제법 생겼다. 전자와 정보통신·데이터 산업에서는 일찍부터 물리적 인프라 건설형 생태계와는 다른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름하여 네트워크 허브(network hub)형. 주력 중심 기업이 중앙에 위치하고 수평적 성격이 가미된 다수의 스포크(spoke·바퀴살)로 불리는 파트너사들이 주변에 배치된 체제다.
스포크가 작다고 무시할 수 있을까. 이들은 혁신의 주체로서 파티에 나선 파트너다. 공정한 대우를 요구한다. 주력 기업의 경영자들도 파트너로서 대우하고 싶어 한다. 물론 수직적 구조에서 진화하는 데도 허브와 연결된 다수의 공급자나 유통사, 그리고 서비스 파트너사 간의 기본적인 규칙과 표준·방향성 등은 중심 기업이 주도한다.
그러면 작은 것은 이제 자유를 만끽하면 될 것인가. 아니다. 독립된 존재로서 인정받는 순간 책임과 존재 가치 정립의 필요가 뒤따른다. 그들은 일차적으로 중심 기업의 성과 향상을 위해 나서야 한다. 이차적으로는 유니콘으로, 데카콘으로, 또 중견기업으로 가야 한다. 부단한 기술과 경영 혁신 없는 스포크는 자유와 평등을 구가할 수 없다.
플랫폼형 상생 생태계도 다수 탄생하고 있다. 단순한 공급자 중심의 네트워크가 아니고 디지털 기술과 브랜드 파워를 핵심 자원으로 하고 각 분야에서 최고의 역량을 가진 다수의 파트너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조정하는 구조. 수평적 구조화. 이것은 광범한 생산 기반을 가진 기업이 강력한 주도력을 발휘하고 계열화나 기술표준을 가지는 반개방형과는 차이가 있다.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딥테크 산업의 대부분이 이 구조로 재편 중이다.
‘성과공유제’도 건강한 기업 간 관계는 물론 혁신적인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의도에서 나왔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상생 협력의 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려는 것도 바로 생태계의 진화를 촉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다. 성과공유제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확산하기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별로 어떤 활동을 성과로 볼 것이며 어떻게 성과 기여분을 공정하게 배분할 것인가를 찾아나가야 한다. 그것에 생태계의 진화가 달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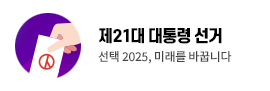








 jhlim@sedaily.com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