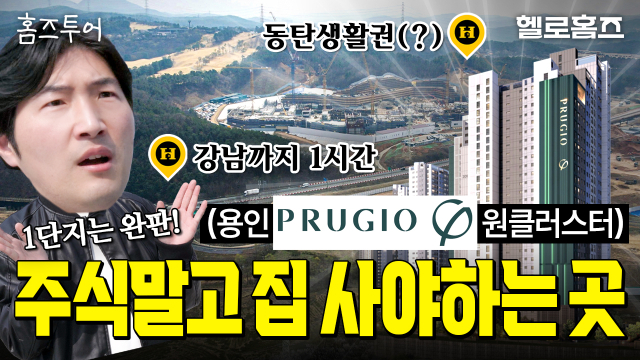나라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기업 간 상생과 동반을 위한 활동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타산이 앞선다는 경제행위라 하더라도 공동체의 존재 가치와 문화를 벗어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꽃밭 독일에는 특화중소기업지원책으로 불리는 다양한 상생 방안이 있다. 국영은행의 장기 저리 융자와 스타트업 투자가 눈에 띈다. 연방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여러 기관이 디지털 전환, 교육·훈련, 공동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특히 공공은행의 다양한 지원책과 100여 개 지역 혁신 클러스터 내에 있는 기업 간 긴밀한 네트워킹이 부럽다. 기업 간에는 장기 공동 기술 개발과 공용 테스트베드 등이 인기다.
일본은 계열사 중심에서 최근에는 수평적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나간 예가 많다. 공존·공영의 모토 아래 기술 공유와 공동 개발이 주류를 이룬다. 도요타에서는 1959년부터 원가 절감과 품질 개선을 위한 성과배분제도를 실시하기도 했다. 합의대로 성과를 일대일로 나눈 사례도 있다. 제조업은 물론 건설업에서 도입하기도 했다.
프랑스는 어떨까. 대중소기업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주도 프로그램인 중소기업동반협약이 2005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르노·에어버스 등이 기술 개발과 장기 계약을 진작한다. 협력 기구는 공공과 민간 파트너십 형태인데 공공 투자 은행과 그 사무국이 활동의 중심에 있다. 우리 동반성장위원회와 유사하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연계와 오픈 이노베이션을 촉진하는 데 주력한다. 자동차와 항공 분야를 넘어 화장품과 에너지 분야에서도 성과를 공유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로열티 배분, 탈탄소화 사업 공동 수행에 이어 취약 계층 일자리 창출에까지 나선다.
노르웨이는 산업연구개발계약(IFU)을 통해 공동 기술 및 신소재 개발과 글로벌화를 지원한다. 미국의 경우 반독점과 불공정거래 차단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기업의 유망 벤처투자가 특징이다.
영국은 민간단체들이 중소기업청과 함께 공급망 혁신, 신속지급제를 통한 납기 지연과 일방적 단가 인하를 방지하고 갈등 조정도 한다. 비즈니스 은행에서 지방 기업을 지원하고 투자자와 파트너사와의 매칭으로 대기업 유통망과 시장 정보 공유를 촉진하는 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방의 농민들을 대기업과 사회적 기업에 연결시키고 있다. 테스코는 소규모 식품 계약을 유연하게 하며 라벨링 가이드와 마케팅을 지원하기도 한다. 영세 농가와 식품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 장벽을 허문다. 정부, 민관 공동의 준정부 기관, 지역 및 민간 협력 기구, 사회적 기업을 위한 국가대표 기관, 왕실 후원 네트워크 등 여러 손이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15년 이상의 연륜이 쌓였다. 프랑스처럼 정부 유도적 성향이 강하고 짧은 시간에 확산을 시도하다 보니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동반성장지수는 그 평가 과정을 규제로 인지할 수도 있지만 대기업이 확대하고 있는 다면적 상생 미덕을 공개하는 수치이기도 하다. 대기업의 동반성장 활동을 생생하게 가시화하는 ‘살아 있는 지수’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협력 업체와 자율상생협약을 맺는 대기업 행사에 가보면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진성 의지를 느낄 수 있다. 이제는 정부가 주도한다는 진입로와 치밀한 타산의 고개를 넘어 상생의 문화 마을로 들어설 때다. 다만 금융 산업이 동반성장의 마을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아쉬움과 대기업이 자신들의 협력 기업 외곽에 있는 외협력기업(外協力企業)을 손님으로 널리 자주 모시지 않는다는 서운함을 느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hlim@sedaily.com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