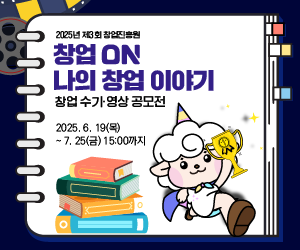189개국. 지난해 한국을 찾아 올리브영 매장에서 쇼핑한 외국인들의 국적 개수다. 유엔 정회원국 수가 193개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전 세계 국가에서 올리브영을 방문한 셈이다. 이들은 전국의 올리브영 매장 1371개 가운데 90%가 넘는 1264개를 방문해 942만 건을 결제했다. K뷰티가 국내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K뷰티의 해외 수출도 활발하다. 지난해 한국 화장품의 수출액은 사상 최대인 102억 달러(약 15조 원)를 기록했다. 프랑스(233억 달러), 미국(112억 달러)에 이은 세계 3위다. 2위인 미국과의 격차는 10억 달러에 불과하다. 한국의 대미 화장품 수출액만 보면 지난해 17억 100만 달러(약 2조 4600억 원)를 기록해 샤넬·디올·생로랑 등 명품 뷰티 브랜드를 보유한 프랑스(12억 6300만 달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1940년대 처음 등장한 국산 화장품은 초기에는 반짝 인기를 끌었지만 수입 제품에 비해 품질 등이 뒤떨어진다는 인식에 오랜 기간 외면을 받았다. 무역수지 측면에서도 화장품은 2011년까지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많은 적자 산업이었다. 하지만 2012년 수출액이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기며 수입액을 앞지르기 시작하더니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대표적인 ‘수출 효자’ 산업이 됐다.
K뷰티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배경으로는 제조·유통·브랜드·소비자 등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조화를 이룬 점이 꼽힌다. 제조에서는 한국콜마·코스맥스 등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들이 뛰어난 기술력을 앞세워 로레알·존슨앤드존슨·록시땅 등 글로벌 뷰티 기업을 고객사로 유치했다. 수많은 인디 브랜드가 소규모 자본과 아이디어만으로 탄생할 수 있었던 것도 탄탄한 제조 기술력을 갖춘 이들 ODM 기업 덕분이다.
여기에다 CJ올리브영이 구축한 온·오프라인 유통망은 인디 브랜드들이 탄생해 다양한 실험을 하며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 CJ올리브영에 따르면 입점 브랜드 중 지난해 올리브영 내 판매 매출 100억 원을 넘긴 브랜드가 100개에 달했다. 판매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한 곳도 메디힐·라운드랩·토리든 등 3개나 있었다. 빅데이터 기반 분석과 시장조사를 토대로 고객의 니즈를 포착해 K뷰티 브랜드 및 제조사의 성장을 지원한 결과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데 거부감이 없고 트렌드에 민감한 한국의 알파 세대와 Z세대 소비자들 역시 K뷰티의 자양분 역할을 했다. 이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기업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K뷰티의 경쟁력이 높아졌다. 산업 생태계의 네 박자가 어우러지면서 가성비와 혁신성을 갖춘 K뷰티가 등장할 수 있었다.
K뷰티 열풍 덕에 화장품 기업들의 실적도 최고치를 갈아 치우고 있다. CJ올리브영의 지난해 매출액은 4조 78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9% 늘었다. 한국콜마는 지난해 13.7% 증가한 2조 4521억 원을, 코스맥스도 21.9% 늘어난 2조 1661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역대급 실적을 올렸다.
하지만 “돈이 된다”는 인식에 묻지 마 창업에 나섰다가 문을 닫는 사례도 급증하는 추세다. 화장품 책임 판매 업체(완성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회사) 수는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2023년 3만 1524개에 달했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2만 7361개로 감소했다. 시장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 무분별하게 진입했다가 1년 새 4000곳 이상이 문을 닫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 K뷰티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K뷰티가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으로 뭉뚱그려 인식되기보다 개별 브랜드, 개별 제품으로 확실히 각인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택지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 국내 소비자들조차 한 브랜드 제품을 꾸준히 사용하기보다는 유목민처럼 여러 브랜드 제품을 돌려 쓰는 추세다. 까다로운 소비자들의 마음이 언제 돌아설지도 모른다. K뷰티 후광에 기대어 한두 개 간판 상품의 반짝 성공에 만족한다면 K뷰티 열풍이 지속되리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nevermind@sedaily.com
nevermin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