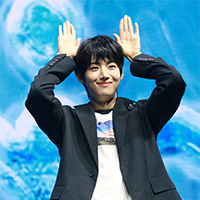“중국은 적절한 비용으로 빠르게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 수많은 기술이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자금이 부족한 국내 신약 개발 기업이 성과를 단축하려면 중국 인프라 활용을 고민해야 합니다.”
조현무 프리미어파트너스 상무는 2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빅파마들은 중국 신약 개발 인프라에서 내놓는 결과물을 끊임없이 스크리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 우정증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중국 제약사의 기술수출 규모는 660억 달러(약 92조 원)에 달한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올 상반기 12조 원의 역대급 기술수출 기록을 세웠다지만 중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다.
조 상무가 생각하는 중국 신약 개발의 가장 큰 강점은 임상까지 진입하는 엄청난 속도에 있다. 그는 “부족한 자금으로 제한된 시간 내 성과를 내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또 자금을 조달하고 상장까지 가야 하는 국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의 협업은 우리 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성과를 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이미 많은 해외 기업들이 그렇게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방법은 중국 기업과 파트너십이다. 리가켐바이오(141080)사이언스가 중국 씨스톤파마슈티컬스와 함께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LCB71(CS5001)’을, 에이비엘바이오(298380)가 중국 아이맵과 이중항체 신약 ‘ABL111(지바스토믹)’을 각각 개발해 임상에 진입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조 상무는 “중국과 협력이 많아지고 있고, 중국에서도 우리 신약 기술에 관심이 커지는 추세”라고 전했다. 중국과 협업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좋지 못한 점은 넘어야 할 장애물이다. 이에 대해 조 상무는 “중국으로 기술이전이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니 많은 국내 기업이 빅파마와 먼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뒤 중국과 후속 계약을 맺는 형태를 선호했다”며 “중국 바이오산업이 괄목할 성과를 거두기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은 만큼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국내 바이오산업 육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는 ‘신속한 품목허가 제도’를 꼽았다. 조 상무는 “규제 측면에서 기업공개(IPO) 등 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여줄 방안은 신속한 승인”이라며 “신약에 다 승인을 내주자는 게 아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빠르게 검토해 승인이든 불승인이든 신속하게 결론을 내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 상무는 최근 유전자치료제와 표적단백질분해제(TPD)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유전자치료제 개발 기업 소바젠과 TPD 개발 기업 프레이저테라퓨틱스에 투자를 단행했다. 그는 “국내외에서 유전자치료제에 개방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기존에 빅파마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은 TPD는 이제 성과가 나올 타이밍이 됐다”고 예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park@sedaily.com
j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