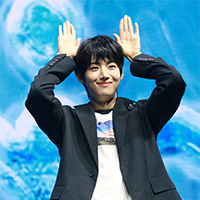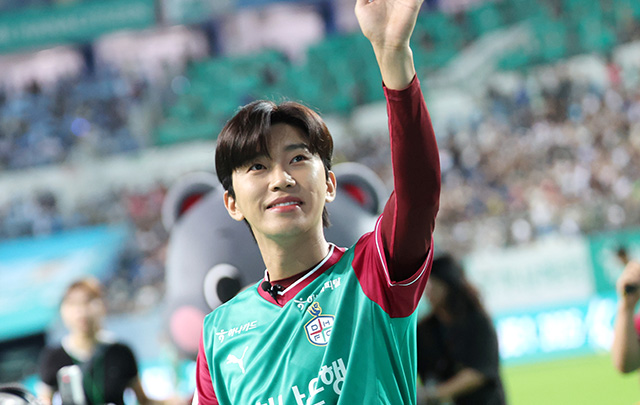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생산성 향상 없이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2일 박정수 서강대 교수와 공동 연구한 ‘임금과 노동생산성 추이,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의 연간 노동생산성(취업자 1인당 GDP)이 주4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 비해서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노동생산성은 6만 5000달러로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22위에 해당했다. 주4일제를 도입한 벨기에(12만 5000달러)·아이슬란드(14만 4000달러)의 절반 수준이며, 시범 운영 중인 프랑스·독일(9만 9000달러), 영국(10만 1000달러)에도 크게 못 미쳤다. SGI는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 향상과 여가 확대를 통한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생산성 향상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연간 생산 실적이 떨어지고 인건비가 늘어나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한국의 임금 인상률이 생산성 증가율을 크게 웃돌면서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화할 경우 기업의 수익성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연간 임금과 노동생산성 증가율(명목 기준)은 각각 연평균 3.2%로 같았다. 하지만 2018년부터 2023년 사이 임금은 연평균 4.0% 올랐지만 노동생산성은 1.7% 상승에 그쳤다.
특히 생산성 향상 없이 근로시간만 단축될 경우 노동집약적 산업과 중견·중소기업의 수익성이 더 악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SGI는 노동집약적 기업의 총자산이익률(ROA)은 2018년 전후 1.8%포인트 떨어져 자본집약적 기업보다 더 크게 하락했으며,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중견기업이 1.5%포인트 떨어져 대기업(0.4%포인트 하락)에 비해 훨씬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일과 삶의 균형을 높인다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이 우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의 탄력적 적용 △노동시장 유연화와 인력 재조정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 등이 검토돼야 한다며 첨단산업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 및 취업 규칙 변경 절차의 합리적 개선 등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unpark@sedaily.com
jun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