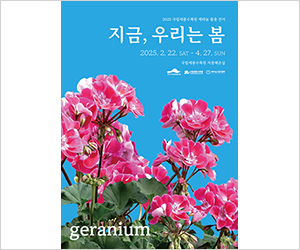“요즘도 (공모)펀드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나요?”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에게 괜찮은 상품을 추천해달라고 하자 돌아온 대답이다. 물론 이 관계자의 말은 공모펀드 시장의 위축이 심하다는 것을 다소 극단적으로 표출한 말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 공모펀드 시장에서 느낄 수 있는 위기감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자산운용업계의 무게 중심이 사모펀드(PEF) 쪽으로 크게 기울어졌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전체 펀드 설정액은 2014년 말(377조원)보다 174조원이 늘었지만 이 중 약 92%(160조원)가 사모펀드의 몫이다. 반면 공모펀드로 들어간 자금은 14조원에 그친다. 이에 따라 전체 자산운용시장에서 사모펀드와 공모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 기간 4대6에서 6대4로 뒤바뀌었다.
물론 시장의 ‘대세’에 따라 사모펀드에 투자하면 좋겠지만 아직 사모펀드는 자산가들의 전유물에 가깝다. 일단 최소 가입금액이 1억원이다. 매달 대출이자와 갖가지 생활비에 허덕이는 틈에서 조금이나마 돈을 불려보겠다는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언감생심에 가깝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공모펀드는 왜 이렇게 위축됐을까. 성과가 투자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부진한 성과는 국내 증시가 좋지 않았던 탓도 크지만 그런 상황임에도 공모펀드에만 적용되는 갖가지 규제가 성과 내는 것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고 업계에서는 토로한다. 가령 여러 규제 가운데 한 종목을 10% 이상 담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대표적이다.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것이지만 이것이 반대로 투자자들의 불만을 초래하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는 반론이다. 반면 규제에서 자유로운 사모펀드는 그 사이에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며 고수익을 추구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니 투자자들이 사모펀드로 달려가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비롯한 증권거래세 인하 등의 정책을 꺼낸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정책만큼 중요한 것이 공모펀드의 활성화다. 정부가 정권의 명운을 걸고 달려든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하루빨리 공모펀드 시장에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ingear@sedaily.com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