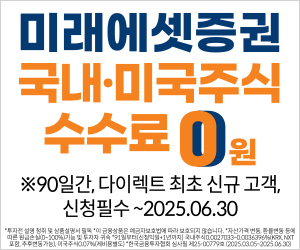“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지역 산업과 연계해 센서 전문가라는 차별화된 반도체 인재양성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대학·기관들에 이런 버티컬(분야별 특화) 전략이 점점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명재(사진) DGIST 차세대반도체융합연구소장은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15만 반도체 인재양성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반도체 산업이 고도화되고 다양해지면서 인재양성 역시 거점별로 전문화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소장의 주장이다. 동남권 정밀화학 산업을 기반으로 소부장(소재·부품·장비)에 특화한 울산과학기술원(UNIST)의 반도체소재부품대학원이 대표 사례다.
이 소장은 “DGIST는 대구·구미 등 영남권 제조 기업이 모인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해 센서 반도체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며 “지난해 산하에 ‘센소리움연구소’를 신설하고 이 분야 연구개발(R&D)과 인재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자율주행차·사물인터넷(IoT) 등에 필요한 센서 반도체는 대기업보다는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다품종 소량 생산 생태계가 필요한데 DGIST가 이에 맞춰 인재 허브 역할을 맡았다는 뜻이다.
이 소장은 “연구소는 두 가지 트랙으로 체계화된 자체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하나는 센서 반도체 R&D와 설계를 담당할 엔지니어, 다른 하나는 센서 반도체만큼 다양한 인프라를 운영할 오퍼레이터(운영자) 양성을 목표로 하며 이들 두 트랙을 합쳐 5년간 150여 명을 양성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이 기업에 입사하거나 기업과 공동 연구·사업화하는 방식으로 지역 센서 반도체 산업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운영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마이칩(대학생 칩 제작 실습)’ 서비스, 대구시의 ‘대구형 반도체 팹(D-FAB)’, 삼성전자의 반도체 계약학과 등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협력 프로그램도 센서 반도체 전략과 연계해서 진행된다. 이 소장은 “특히 DGIST 팹을 통해 마이칩 서비스에 참여하는 학생은 5년간 3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 모두 직·간접적으로 센서 반도체 공정을 습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ookim@sedaily.com
sookim@sedaily.com